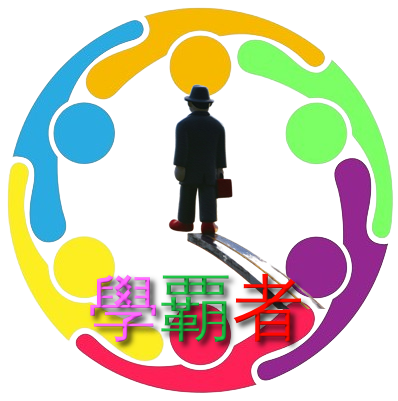[동추 거문고 이야기]〈1~12〉연재를 시작하며, 설중매와 가장 잘 어울리는 악기 거문고…맑은 기운 도는 성인군자 닮아
[동 추 거문고 이야기] <12〉 강세황과 거문고
강세황(1713~1791)은 70대의 나이에 청나라 사신의 일행으로 중국 베이징에 갔을 때 많은 현지인들이 그의 그림을 구하려 할 정도로 유명했던 화가였지만, 과거시험 장원급제(6..
www.yeongnam.com
- 김봉규 문화전문 칼럼니스트
 |
조선 성종 때 '악학궤범' 편찬을 주도한 용재 성현(1439~1504)은 음악에 능통했음은 물론, 차(茶)도 즐겼던 문인 풍류객이었다. 그는 특히 거문고에도 뛰어났는데, 그만이 그 묘법을 얻었다는 평을 듣기도 했다. 성현이 지은 '용재총화'는 조선시대 수필문학의 백미로 꼽힌다. 그에게 우의정을 지낸 아들 성세창(1481~1548)이 있었다.
기재(寄齋) 박동량(1569~1635)이 지은 '기재잡기(寄齋雜記)'에 전하는 이야기다.
성세창의 친한 친구 홍정(洪正)은 성세창과 서로 통하는 친구였다. 그가 정월 어느 눈 내린 날 밤에 친구가 생각나 성세창을 찾아갔다. 동원(東園) 별실 창 아래서 담소를 나누고 있던 중, 갑자기 어디선가 거문고 소리가 들려왔다.
창틈으로 가만히 내다보았더니 백발을 휘날리는 한 노인이 매화나무 밑에 눈을 쓸고 앉아 거문고를 타고 있었다. 그 손끝에서 청아한 소리가 울려 나오고 있었다. 노인은 세속 사람이 아닌 신선과 같은 모습이고, 거문고 소리 역시 너무나 맑고 아름다웠다. 그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던 성세창은 노인이 바로 자신의 아버지인 성현임을 알아보고, 자신의 부친이라고 말했다. 잠시 후 그 노인은 어느새 손님이 방에 있는 줄 알았는지, 서둘러 거문고를 거두고 들어갔다.
홍정은 뒷날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었던, 이 인상적인 장면을 다음과 같이 글로 써서 남겨놓고 있다.
'그때 달빛이 밝아 대낮 같고 매화가 만개했는데, 백발은 바람에 날려 나부끼고 맑은 음향이 매화향기를 타고 흘렀다. 마치 신선이 내려온 듯, 문득 맑고 시원한 기운이 온몸에 가득함을 느꼈다. 용재 선생은 참으로 선풍도골(仙風道骨)의 풍류객이라 할 만하다.'
옛글 중 매우 인상 깊었던 내용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떠올리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음력 정월이면 양력으로는 2월이나 3월일 것이니, 일찍 피는 매화는 꽃봉오리를 터뜨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눈 오는 날이면 말 그대로 설중매(雪中梅) 풍경이 펼쳐질 것이다.
설중매에 거문고보다 더 어울리는 악기가 있을까 싶다. 언젠가 나도 이와 같은 풍류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곤 했다.
매화와 눈으로 덮인 천지
포대기에 싼 거문고 메고
초옥 향해 걸어가는 선비
청아한 소리·아름다운 풍경
온갖 마음 다스리는 반려자
수많은 사연·이야기 담은듯
 |
◆매화초옥도 이야기
그림에도 이와 비슷한 풍류가 떠오르는 작품이 있다. 매우 좋아하는 그림인데, 고람(古藍) 전기(1825~1854)의 '매화초옥도(梅花草屋圖)'이다.
'매화초옥도'는 눈 내린 날, 산속 초가 주위에 늘어선 매화나무에 흰 꽃이 만개한 풍경이다. 산봉우리마다 눈으로 덮여 있지만, 초봄인지 곳곳에는 새싹이 돋아나고 있다. 그리고 골짜기 따라 늘어선, 커다란 고목 매화나무마다 꽃을 활짝 피우고 있다. 매화는 흰 점을 무수하게 찍어 표현했는데, 마치 목화 꽃을 보는 듯하다. 맑은 기운이 감도는, 저절로 기분이 좋아지는 풍경이다.
매화와 눈으로 덮인 천지는 맑고 고요한데, 초옥 안에는 연둣빛 옷을 입은 한 남자가 밖을 내다보며 앉아 있다. 설중매 풍경을 감상하며 멋진 친구를 기다리고 있다. 초옥 아래에 있는, 눈 덮인 다리 위에는 붉은 도포를 입은 한 인물이 초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어깨에 뭔가를 메고 있다. 바로 포대기에 싼 거문고다.
설경 속 두 인물을 원색 옷으로 표현해 전체 풍경에 생동감을 더한다. 두 사람의 기분이 약간 들떠 있는 듯한 기운이 느껴지기도 한다.
그림의 오른쪽 아래에는 '역매인형초옥적중(亦梅仁兄草屋笛中)'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 '역매 형이 초가 안에서 피리를 불고 있다'라는 뜻이다. '역매(亦梅)'는 오경석(1831~1879)의 아호다. 그가 초옥의 주인임을 말해준다. 그리고 거문고를 메고 그를 찾아가는 사람은 이 작품을 남긴 전기 자신이다.
역관(譯官)이자 서화가였던 오경석은 매화를 너무나 좋아한 '매화광'이었다. '역매'와 더불어 '야매(野梅)' '일매(逸梅)'를 자신의 아호로 삼았다. 그런 그에게 잘 어울리는 초옥이다.
전기는 추사 김정희에게 서화를 배웠다. 고람이라는 아호도 김정희가 그의 걸출한 재능을 아껴 지어준 것이다. 서른을 넘기지 못하고 요절한 전기는 당대의 걸출한 문인과 서화가들이 입을 모아 극찬한 천재 작가였다.
실제 상황을 담은 것으로 보이는 이 그림의 두 주인공이 이날 거문고와 함께한 시간이 어땠을까 상상해본다. 전기는 거문고를 매우 좋아했고, 또한 즐겨 연주했던 것 같다. 더할 수 없이 좋은 날, 마음 통하는 사람과 설중매의 분위기를 즐기는 자리에 거문고가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리라.
설중매가 피어난 날 거문고를 등장시킨 것에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거문고가 설중매에 어울리는 이유는 단순히 그 음색 때문만은 아니다. 거문고를 좋아한 전기는 거문고가 선비를 비롯한 당시 지식인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고 있었을 것이다.
거문고는 선비들에게 사심과 욕심을 다스리는, 성인군자의 마음을 갖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반려로 여겼던 악기다. 그리고 매화는 맑은 마음, 성인의 마음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설중매에 가장 잘 어울리는 짝이 거문고이지 않았을까 싶다.
◆거문고와 나
30여 년 전 늦은 봄날, 문경새재로 가는 길을 걷고 있었다. 반가운 악기 연주 소리가 들려왔다. 숲속 정자에서 누가 거문고를 연주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 소리를 따라 20여 분 동안 가보았다. 그곳은 식당 겸 가게였고, 거기서 틀어놓은 가야금 카세트 테이프가 '연주자'였던 것. 김죽파의 가야금 산조 연주였는데, 당시는 거문고 소리와 가야금 소리를 구분하지도 못했다.
거문고에 대한 막연한 호감을 가지고 있다가 2001년 직장 동료들과 거문고 연주를 배우기 시작했다. 2년 정도 열심히 배우다가 가르치는 선생님이 교통사고를 당해 팔을 다치고 배우던 동료들도 사정이 생기면서 그만두게 되었다. 그 후 거문고는 먼지만 뒤집어쓴 채 방치되다가, 2014년부터 다시 거문고를 배우기 시작했다. 요즘도 거문고를 수시로 연주하고 있다. 그리고 거문고에 관한 옛날 기록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아왔다.
'선비의 악기'로도 불리던 거문고는 옛날부터 선비들이 마음 수양의 반려로 삼아온 악기다. 그런 만큼 거문고는 수많은 사연과 이야기를 담고 있다. 거문고와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가 보고자 한다.
[동 추 거문고 이야기]〈2〉거문고와 매화, 선현의 道 같은 매화 찾아…거문고 벗 삼고 구도의 길
- 김봉규 문화전문 칼럼니스트
 |
연재를 시작하면서 고람의 '매화초옥도' 이야기를 언급했는데, 거문고와 인연이 깊은 매화 이야기를 한 번 더하고 가려고 한다.
매화는 추위가 덜 가신 이른 봄날, 잔설 속에서도 어떤 초목보다 먼저 꽃을 피워 맑고 은은한 향기를 선사한다. 그 자태도 고고하고 아름답다. 춥고 험준한 설산의 매화, 고귀한 설중매는 선비들에게 단순한 꽃이 아니었다. 그들이 추구하는, 도달하고자 하는 이상향을 상징했다.
당나라 맹호연 고사 소재 '파교심매도'
다리 건너 눈 덮이고 험준한 산속으로
거문고와 함께 단출히 떠나는 탐매길
'탈속하고 고아한 선비' 대명사로 꼽혀
사육신 중 한 사람인 매죽헌(梅竹軒) 성삼문은 매화를 이렇게 찬미했다.
'매화는 맑고 지조가 있어 사랑스러우며, 향기로운 덕을 지니고 있어 공경할 만하다(余惟梅之爲物 有淸操焉可愛也 有馨德焉可敬也).'
조선 후기의 가객(歌客) 안민영은 '영매가(詠梅歌)'에서 매화를 '아치고절(雅致高節·우아한 풍치와 고상한 절개)'이라는 말로 표현했고, 매화를 특히 사랑한 퇴계 이황은 매화를 신선에 비유하며 '매선(梅仙)'으로 부르기도 했다.
이런 매화는 거문고의 짝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 매화는 사군자(四君子·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중 첫 번째 군자로, 선비들이 학문(유학)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군자(유교에서 추구하는 이상적 덕목을 갖춘 인간)를 상징한다. 그리고 불교의 선사(禪師)들이 추구하는 깨달음(부처의 경지)에 비유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처럼 도를 추구하는 이들은 매화(도)를 찾아갈 때, 또는 매화를 만났을 때 함께해야 하는 반려 악기로 거문고를 생각했던 것 같다.
그래서인지 매화를 찾아가는 탐매를 주제로 한 그림인 탐매도에 거문고가 등장하는 작품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탐매도로 심사정의 '파교심매도', 신잠의 '탐매도', 김명국의 '탐매도' 등이 꼽힌다.
◆심사정 '파교심매도'
조선 후기 선비 화가인 현재(玄齋) 심사정(1707~1769)의 '파교심매도'는 탐매도 중 걸작으로 꼽힌다. '파교를 건너 매화를 찾아가다'라는 의미의 이 작품은 심사정이 59세 되는 해인 1766년 여름에 그린 것이다. 이 그림의 주제인 '파교심매'는 중국 당나라 시인 맹호연(689~740)의 고사를 소재로 하고 있다.
대표적 산수전원파 시인 맹호연은 허베이성 출신으로 40세쯤에 장안(長安·지금의 시안)으로 가서 진사 시험을 쳤으나 낙방한 후 고향에 돌아와 은둔생활을 하였다. 도연명(陶淵明·365~427)을 존경한 그는 평생 유랑과 은둔생활을 하며 술과 금(琴)을 벗 삼아 자연의 한적한 정취를 사랑한 작품을 남겼다. 그는 이른 봄 매화를 찾아 당나귀를 타고 장안 동쪽의 '파교'라는 다리를 건너 눈 덮인 산으로 들어가 매화를 찾아다녔다고 한다.
맹호연의 이 고사는 탈속하고 고아한 선비의 대명사로 인식되면서 '파교심매' '설중탐매(雪中探梅)'의 모습으로 그림에 등장한다. 이 그림에는 어딘가에 매화가 피어있을, 눈 쌓인 적막한 산속을 향해 나귀를 타고 다리를 건너는 선비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그리고 음식과 술, 문방구 등 필요한 것을 담은 보따리를 들고 뒤따르는 시동이 함께한다.
심사정의 이 파교심매도를 보면 눈 쌓인 겨울 산을 배경으로 선비가 당나귀를 타고 다리를 건너려고 하고 있다. 다리 건너 산은 사람이 범접하기 어려운 험준한 바위산들임을 알 수 있다. 나뭇가지에는 눈이 쌓여 있고, 산봉우리 곳곳에도 눈이 아직 남아있다. 이런 위험한 길을 선비는 왜 가려고 할까. 구도의 길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매화는 진리 또는 도를 상징하고, 선비는 보이지도 않는 그 매화를 찾아 위험도 마다하지 않고 길을 나서는 것이다.
나귀를 탄 선비는 모자를 쓰고 온몸을 망토로 휘감아 단단히 방한 채비를 한 모습이다. 그 뒤를 어깨에 문방구, 술과 음식 등을 싼 두 개의 보자기를 걸친 긴 막대기를 어깨에 멘 시동이 뒤따르고 있다. 그리고 막대기에는 거문고를 싼 보따리도 함께 매어져 있다.
탐매의 행로에 거추장스럽다고 할 수 있는 거문고를 굳이 준비해가는 데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 아닌가. 매화는 단순한 봄꽃이 아니고, 거문고 또한 그 선율을 즐기기 위해 연주하는 데 그치는 악기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매화는 선비들이 추구하는 성인군자의 경지를 의미하고, 거문고는 그런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 욕심을 다스리는 수행의 도반으로 삼은 악기였던 것이다.
◆이황의 매화와 거문고
성현(聖賢)으로 존경 받는 '공자' '맹자' '노자' 처럼 '이자(李子)'라고도 불릴 정도로 훌륭한 선비이자 대학자였던 퇴계 이황 역시 매화와 거문고를 사랑했다. 이황은 매화시를 많이 남겼는데 그중에 이런 시가 있다.
'옛 책을 펴서 읽어 성현을 마주하고(黃卷中間對聖賢)/ 밝고 빈 방안에 초연히 앉아(虛明一室坐超然)/ 매화 핀 창가에 봄소식 보게 되니(梅窓又見春消息)/ 거문고 줄 끊어졌다 탄식하지 않으리(莫向瑤琴嘆絶絃)'
임자년(1552년) 입춘에 쓴 이 시는 빈 방에 혼자 앉아 책을 읽으며 옛 성현의 가르침을 이어가는 선비의 생각을 묘사하고 있다. 창가에 핀 매화를 본다는 것은 자신이 성현의 도를 밝히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 거문고 줄이 끊어졌다라고, 즉 성인의 도가 끊어졌다 탄식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창설재(蒼雪齋) 권두경(1654~1725)이 이황의 도학을 기리기 위해 1715년 안동의 퇴계 유허지에 추월한수정(秋月寒水亭)을 건립한 후 지은 '이운재(理韻齋)' 찬문이다.
'보갑에 든 옥거문고(寶匣瑤琴)/ 줄이 끊어진 지 오래이네(絃絶多年)/ 퇴계 선생이 먼 세월을 이어(先生遠紹)/ 그쳐버린 거문고 소리 다시 전하였네(輟響再專)/ 경전을 대하는 매화창에(黃卷梅窓)/ 봄소식이 몇 번이나 돌아왔던가(幾回春信)/ 힘쓰도록 하라 후생들이여(勖哉後生)/ 부디 여운을 다스려 닦아보세(尙理餘韻)'
거문고 줄이 끊어졌다는 것은 성인(공자)의 도학이 이어지지 못한 것을 상징하고 있다. 권두경은 이황이 끊어진 거문고 소리를 다시 이어 매화를 해마다 볼 수 있게 했다고 비유하면서, 그 여운을 받아 다스리자는 뜻으로 '이운재'라는 이름을 지은 것이다.
[동 추 거문고 이야기] 〈3〉 '백악지장' 거문고, 고구려 고분 벽화 곳곳 연주하는 모습 묘사…선비가 책과 함께 늘 곁에 둔 마음수양 반려
 |
우리나라의 대표적 전통 현악기인 거문고는 오래 전부터 '백악지장(百樂之丈)'이라 불리어 왔다. '모든 악기 중 으뜸'이라는 의미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지식인, 특히 선비들이 그윽하고 담백한 거문고의 음색과 거문고에 담긴 의미를 사랑하고 존숭해 최고의 악기로 대접했던 것이다.
'현금(玄琴)'으로 불리어온 거문고는 고구려에서 처음 만들어졌다. 무용총을 비롯한 고구려 고분 벽화 곳곳에도 거문고의 원형으로 보이는 현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거문고의 기원과 관련해서는 김부식의 '삼국사기' 기록이 흔히 인용된다.
무용총 등 그려진 거문고의 원형
왕산악이 100여 곡 만들어 연주
검은학이 와 춤춰 '현학금' 불러
160㎝ 긴 몸통에 6현 얹은 구조
음 높낮이 조절 받침대 '괘' 16개
명인 거치면서 민간에 널리 퍼져
'심성 수양' 악기로 중요한 역할
'신라고기(新羅古記)에서 거문고 제작과 관련해 이렇게 이야기했다. 처음에 진나라 사람이 칠현금(七絃琴)을 고구려에 보냈는데, 고구려 사람들은 비록 그것이 악기인 줄은 알았으나 그 성음(聲音)과 연주법을 알지 못했다. 나라에서 사람들 중에 그 음률을 알아서 연주할 수 있는 자를 구하면서 후한 상을 주겠다고 했다. 그때 둘째 재상(第二相)인 왕산악이 칠현금의 본 모양은 그대로 두고 그 법제(法制)를 고쳐서 다시 만들었다. 그리고 100여 곡을 만들어 그것을 연주했다. 이때 검은 학이 와서 춤을 추니 현학금(玄鶴琴)이라고 부르게 되었으며, 이후 다만 현금(玄琴)이라고 하였다.'
 |
왕산악이 언제 거문고를 만들었는지는 삼국사기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왕산악은 거문고를 만든 거문고 명인이지만, 그의 생몰연도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가 거문고를 만든 연대는 문헌자료와 고고학 자료를 근거로 4세기 무렵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357년에 축조된 안악(安岳) 제3호분 벽화에 그려진 거문고 연주 모습, 집안(集安) 무용총(4세기 말~5세기 초) 벽화에 나타난 거문고 연주 모습 등이 그러한 추정의 근거가 되고 있다. 고구려에 칠현금을 보낸 중국 진나라는 동진(東晉·316∼419)일 것으로 추정된다.
고구려 고분 벽화 속 연주자들이 왼손으로 줄을 누르고 오른손으로 술대를 잡고 연주하는 모습은 현재의 거문고 연주법과 비슷하다. 고구려 벽화의 거문고(6현이 아님)는 원형의 거문고이고, 여섯 줄인 현재의 거문고는 그 거문고가 언젠가부터 개작되어 오늘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여섯 줄과 16괘
거문고(玄琴)는 명주실을 꼬아 만든 여섯 개의 줄을 울림통 위에 긴 방향으로 나란히 얹고, 술대라는 막대기로 내리치거나 뜯어 연주한다.
거문고는 긴 몸통에 줄 받침대인 괘 16개를 놓고, 괘와 안족(雁足) 위에 여섯 줄(6현)을 얹은 구조이다. 여섯 줄 중 셋째 줄인 대현(大絃)이 가장 굵고, 첫째 줄 문현(文絃), 여섯째 줄 무현, 넷째 줄 괘상청, 다섯째 줄 괘하청, 둘째 줄 유현(遊絃)의 순으로 가늘어진다. 몸에서 가장 가까운 줄인 첫째 줄이 문현이다. 유현, 대현, 괘상청은 괘(제1괘) 위에 얹혀 있다. 나머지 문현, 괘하청, 무현은 기러기발 모양의 안족으로 받친다. 안족을 이동해 그 줄의 소리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다.
선율을 내는 데 주로 쓰이는 줄은 유현과 대현이다. 이때 왼손은 괘를 짚어 소리에 굴곡과 변화를 주는데, 이를 농현(弄絃)이라 한다.
거문고의 몸통은 길이가 보통 160㎝ 정도. 몸통은 두 쪽의 나무를 아래위로 붙여서 만든다. 현이 올라가는 둥근 위쪽은 오동나무로 만들고, 평평한 아래쪽은 밤나무로 만든다. 몸통의 속은 비어 있어서 울림통 역할을 한다.
음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받침대인 16개의 괘는 아래쪽부터 머리 쪽으로 올수록 점점 작아진다. 첫째 괘에서 열여섯 번째 괘로 가면서 점차 작고 얇아진다. 괘 하나를 올라올 때마다 음은 한 음 높아진다.
거문고의 머리 쪽에는 '대모(玳瑁)'라고 하는 부드러운 가죽을 붙여서, 술대가 몸통 판에 부딪혀 부러지거나 잡음을 내지 않도록 하고 있다. 대모라는 명칭은 본래 거북이 등가죽 말린 것을 붙이던 데서 비롯된 것이다. 술대는 대나무(해죽)로 만드는데, 길이는 20㎝ 정도. 기본적인 연주 자세는 반가부좌이다. 오른다리가 바깥으로 나와 왼다리 아래쪽으로 들어가게 한다. 거문고는 머리 쪽, 즉 대모가 붙은 곳을 오른쪽 무릎에 올려놓는다. 머리 안쪽의 오목한 곳을 오른쪽 무릎 쪽으로 괴고, 왼쪽 무릎과 오른발로 거문고를 받친다. 요즘은 악기 받침대를 많이 사용한다.
◆지식인들의 각별한 사랑을 받은 거문고
거문고는 고구려에서 태어나 신라 때 지리산에서 50년 동안 거문고를 공부한 옥보고(玉寶高)를 비롯해, 그의 제자인 속명득(續命得), 속명득에게 연주법을 전수받은 귀금(貴金), 극종(克宗) 등 거문고 명인을 거치면서 민간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 극종은 새로 거문고 곡 7곡을 지었는데, 이후부터 거문고를 업으로 삼는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극종이 지었다는 7곡은 전하지 않는다.
신라에서는 거문고를 국가 보물 창고인 천존고(天尊庫)에 신령스러운 악기인 신기(神器)로 보관했다고 전해진다. 이후 고려를 거쳐 조선에 이르기까지 거문고는 특히 선비의 아낌없는 사랑을 받았다. 선비들은 거문고에 단순한 악기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마음 수행의 반려로 삼았던 것이다.
옛 선비들은 거문고를 책과 함께 늘 곁에 두고 마음을 다스렸다. 그래서 유교경전을 중심으로 한 책과 거문고를 지칭하는 '금서(琴書)'는 선비를 지칭하는 말로도 통했다. 거문고는 이처럼 선비의 심성을 수양하는 악기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거문고를 가까이에 두고, 거문고를 통해 늘 사심(邪心)과 욕심이 스며들 수 없도록 조심했던 것이다.
거문고가 지식인들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음은 지금까지 전해오는 옛날 악보 대부분이 거문고 악보인 점에서도 알 수 있다. 금합자보, 현금신증가령, 삼죽금보, 한금신보, 현금오음통론, 금보, 신작금보, 학포금보 등 현재 전하는 고악보의 90% 정도는 거문고 악보이다. 서유구가 지은 백과사전인 '임원경제지'의 악보편인 '유예지(遊藝誌)'의 주 내용도 거문고 악보이다.
거문고 관련 최고의 저술로는 1620년 이득윤이 지은 '현금동문유기(玄琴東文類記)'가 꼽힌다. 거문고의 구조와 타는 법은 물론, 거문고에 새긴 글귀인 금명(琴銘)을 비롯해 거문고와 관련된 시와 글, 거문고 악보 등 당시까지의 거문고 관련 기록을 집대성한 책이다. 김봉규<문화전문 칼럼니스트> bg4290@naver.com
[동 추 거문고 이야기] 〈4〉거문고와 중국 칠현금, '선비의 악기' 거문고…진나라가 고구려에 전한 칠현금이 시초
- 김봉규 문화전문 칼럼니스트
악기 위상·상징성 거문고가 이어받아
여섯개 줄 중 첫째 문현·여섯째 무현
현의 이름도 中 문왕·무왕서 유래해
악기의 구조·연주방식 등 다르지만
마음수양 도구로 가까이 한 점 닮아
 |
중국의 금(琴)은 악기가 차지하는 위상이나 상징성 등에서 우리나라의 거문고와 자주 나란히 거론된다. 금과 거문고는 단순히 그 선율을 즐기기 위한 악기가 아니라, 지식인들이 마음수행의 도구이자 반려로 삼았던 악기다. 중국에서는 고대부터 금을 군자(君子)의 악기로 떠받들었고, 우리나라의 거문고는 선비의 악기로 대접받았다. 그리고 우리의 옛 기록에는 거문고를 한자로 표현할 때 '금(琴)'으로 표기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중국의 금인 칠현금 역시 '금(琴)'으로 표기했다.
◆중국 금(琴), 칠현금
중국의 대표적 전통 악기인 금(琴)은 지금도 사랑받고 있는 현악기인데, 일곱 줄로 된 칠현금(七絃琴)이다. '고금(古琴)'이라고도 불린다. 금의 길이는 110㎝ 정도. 거문고의 3분의 2 정도 된다. 금은 일곱 줄로 되어 있어서 '칠현금(七絃琴)'이라 불린다. 고대의 다섯 줄 금은 '오현금(五絃琴)'으로 불리었다.
오현금은 4천300년 전 중국 고대의 태평성대 시대로 일컬어지는 요순시대의 순임금이 처음 만들어 연주했다고 한다. 칠현금의 전신이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옛날 그림 '남훈전탄금(南薰殿彈琴)'은 순임금이 황제의 처소인 남훈전에서 오현금을 타면서 노래로 백성의 고단함을 달랜 내용을 그린 작품이다. 그림 중앙에는 소박한 초옥이 있고, 초옥 안에서 순임금이 오현금을 타면서 노래를 부른다. 신하들은 방 안과 섬돌 아래에 서서 순임금이 연주하는 오현금 소리를 듣고 있다.
순임금은 '오현금을 타면서, 남풍이란 시를 노래하며 천하를 다스렸다(彈五絃之琴 歌南風之詩 而天下治)'고 전한다. '남풍(南風)' 시는 다음과 같다. '훈훈한 남풍이 불어오니, 우리 백성들의 시름을 풀어줄 만하네/ 남풍이 때맞춰 불 때 우리 백성들의 재물도 넘쳐나겠구나(南風之薰兮 可以解吾民之兮 南風之時兮 可以阜吾民之財兮).'
칠현금은 오현금에 중국 주나라 문왕과 무왕이 각각 문현(文絃)과 무현(武絃)을 한 줄씩 더하여 칠현의 금이 되었다고 한다. 즉 순임금 시절에는 오현금이었고, 주나라 때 칠현금이 나와 이후로 유행하게 된 것이다. 중국 진(晉)나라가 고구려에 전해준 거문고도 칠현금이었다. 금의 앞판은 오동나무, 뒤판은 밤나무로 만든다. 보통 검은 칠을 한다. 줄은 따로 기러기발 등으로 받치지 않고, 대신 몸통 위 한쪽에 흰 조개껍질 등으로 만든 지판(徽)을 표시하고 그 자리를 왼손으로 짚어 소리 낸다.
동양의 전통적 세계관이던 '천원지방(天圓地方)' 사상을 반영하여, 위판은 곡면으로 둥글게 하고 아래판은 평평하게 만든다. 악기의 모든 치수에는 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리고 금은 거문고와 같이 같은 줄에서도 어느 곳을 짚느냐에 따라 음이 달라진다. 삼국사기의 '거문고는 중국의 금을 본떠 만들었다'라는 기록이 아주 신빙성 없지는 않음을 보여준다. 구조는 확실히 다를지라도 줄을 집는 방식인 안현법을 비롯한 연주법 등을 참고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금을 연주할 때는 보통 악기를 받침대인 탁자에 올려놓고 손으로 짚으면서 뜯는다.
 |
◆차이점과 영향
거문고와 중국 금은 많은 차이가 있다. 줄의 수만 다른 것이 아니다. 거문고는 괘와 안족이 있는데 반해, 중국 금은 이런 음 높이 조절용 부속품이 따로 없다. 그리고 일곱 줄 모두 악기 위판에 직접 닿도록 손가락으로 짚어 연주한다. 줄을 짚을 위치를 가늠하기 편하도록 몸통 위 한 편에 자개나 옥돌 등으로 만든 '휘(徽)'를 일렬로 박아 놓았다.
거문고는 연주할 때 술대를 사용하지만, 중국 금은 다른 도구 없이 맨 손가락으로만 탄다. 거문고는 대체로 바닥에 앉아, 악기 한쪽 끝을 무릎 위에 걸치고 반대쪽 끝을 바닥에 닿도록 놓고 연주한다. 하지만 중국 금은 탁자에 올려놓고 의자에 앉아 연주하는 것이 원칙이다. 거문고 여섯 줄의 조율은 음 높이 순이 아니지만, 중국 금의 일곱 줄은 가장 바깥 줄을 최저음으로 하여 안쪽(연주자 몸쪽)으로 올수록 높아지도록 조율한다.
금은 중국 문명과 역사를 같이할 정도로 오래되었고, 상류층과 지식인 계층에게 특히 사랑받은 악기이다. 전통적으로 중국에서는 '악기의 아버지' '성인(聖人)의 악기' 대접을 받아 왔다. 한국 전통음악에서 거문고가 누리는 지위와 상징성은 이런 중국 금의 지위를 많이 물려받았다. 중국 한나라 때인 서력기원 전후부터 쓰인 '금(琴)이란 사악함을 금(禁)하는 것이다(琴者 禁也)'라는 말도 그대로 수용되었다. 악기 구조에서 위판이 곡면이고 아래판이 평평한 것은 하늘이 둥글고 땅이 반듯함을 각각 상징하고, 거문고의 문현과 무현은 중국 고대 성인들인 문왕(文王)과 무왕(武王)의 이름에서 유래한 점 등은 중국 금의 영향이다.
한국의 풍류방(風流房) 음악에 중국 금이나 금론(琴論)이 들어온 예도 있다. 중국 금의 덕목인 '오능(五能, 연주해도 되는 다섯 가지 상황)' '오불탄(五不彈, 연주하면 안 되는 다섯 가지 상황)' 등은 17세기 말부터 한국의 거문고 악보들에 마치 거문고의 덕목처럼 인용되어 왔다.
◆'금(琴)'자의 해석
우리나라 옛 한문 기록에서 그냥 '금(琴)'이라고만 한 경우 정확히 무슨 악기를 지칭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을 때가 많다. 같은 '금(琴)'자로 표현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중국의 금인지 한국의 거문고인지 가려서 읽을 필요도 있다. 악기의 구조나 연주 방식 등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고 분명히 다른 악기이지만, 거문고와 금이 한국과 중국에서 차지하는 문화적인 위치가 비슷해 혼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옛 기록에서 거문고, 가야금 등의 현악기를 가리킬 때 그냥 '금(琴)'이라고만 쓰는 경우도 적지 않다. 대부분은 앞뒤 문맥에 의해 무슨 악기를 말하는지 알 수 있다. 분명하지 않고 혼란스러울 때도 있는데, 앞뒤 맥락이나 그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한다.
[동 추 거문고 이야기] <5> 선비와 거문고(상), 거문고는 '금(琴)'이다
- 김봉규 문화전문 칼럼니스트
공자 "사람의 마음을 배우는 소리"
'사심' 금하고 '仁'의 마음을 함양
군자가 곁에 두고 나쁜기운 쫓아내
연주할때 지키는 '오불탄의 원칙'
맑은 정신·바른 자세·의관 갖춰야
 |
한국의 거문고와 중국의 금(琴·칠현금)은 다른 악기이지만, 옛날에는 '금(琴)'으로 동일하게 표기되어 왔다. 거문고와 칠현금을 지칭한 금(琴)은 선비들에게는 단순한 악기가 아니었다. 마음 수양을 위한 평생의 반려로 삼았던 특별한 악기였다. 거문고(칠현금 포함)가 이처럼 선비에게 각별한 대접을 받았던 역사의 뿌리는 매우 깊다.
사마천은 중국 역사서 '사기'에서 '공자가 사양(師襄)에게 거문고 타는 법을 배웠는데, 거문고를 배우는 것은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다'라고 했다. 모든 선비들의 스승인 공자가 거문고를 어떻게 대했는지 알게 하는 대목이다. 거문고를 잘 탔고 음악에 조예가 깊었던 공자는 또한 음악을 통해 인과 예를 설명하고 가르쳤다. 공자가 행단(杏亶)에서 제자들을 가르쳤다는 행단고슬(杏亶鼓瑟) 고사에도 금(琴)을 타는 공자가 등장한다.
◆거문고를 마음 수양의 도구로 삼았던 선비
우리나라 악기 중 유일하게 보물로 지정된 탁영금(濯纓琴)의 주인공 탁영 김일손(1464~1498)이 이 거문고를 걸어두는 시렁에 새긴 글인 금가명(琴架銘)이 있다. '거문고는 내 마음을 단속하는 것이다. 시렁을 만들어 높이 걸어두는 것은 소리가 좋기 때문만은 아니다(琴者 禁吾心也 架以尊 非爲音也).'
김일손이 이런 글을 지어 새기게 된 데는 연원이 있다. 거문고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공자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다. 중국 후한 말기 학자 응소가 편찬한 '풍속통의(風俗通儀)'에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 '거문고를 금(琴)이라고 하는 것은 군자가 바른 것을 지켜서 스스로 금(禁)한다는 데서 나온 말이다. 즉 거문고 소리가 울려 퍼지면, 바른 뜻을 감동시키기 때문에 선한 마음이 스스로 우러나서 사악한 마음이 생기는 것을 막아준다. 그래서 성현 군자들은 거문고를 타면서 항상 조심하고 스스로 사악한 것과 금할 것을 조절하였다고 한다.'
'풍속통의'는 당시의 풍속, 음악, 지리, 종교, 민속, 명물, 전례, 악기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다. 성리학을 집대성한 중국 송나라 유학자 주희(주자)는 거문고에 새긴 금명(琴銘)에서 이렇게 읊었다. '그대 중화의 바른 성품을 길러서(養君中和之正性)/ 분노와 탐욕의 사심을 물리치네(禁爾忿欲之邪心)/ 천지는 말이 없고 만물에는 법칙이 있으니(乾坤無言物有則)/ 내 오직 그대(거문고)와 그 심오함을 찾으리(我獨與子鉤其深).'
선비들이 존경하며 그 삶을 본받고자 한 대표적 선비이자 시인인 도연명(365~427)은 '무현금(無絃琴)'의 세계를 드러내 보였다. '줄 없는 거문고'를 말하는 무현금의 정신과 가치관은 선비들이 유교 경서와 함께 거문고를 필수 반려로 삼게 만드는 데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김일손을 비롯한 우리나라 선비들도 이와 같은 가치관을 이어받고 심화시켰다. 반계(磻溪) 류형원(1622~1673)도 거문고에 새긴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마음은 소리로 나타나고(心形聲)/ 소리는 마음을 감동시키네(聲感心)/ 담박하면서도 조화로우며(淡乃和)/ 정중하고 지나치지 않노라(莊不淫)/ 마음과 어울리고 기와 어울리며 천지와 어울리니(心和氣和天地和)/ 아 금(琴)이란 금할 금(禁)자의 뜻이 있으니(嗚乎琴者禁也)/ 금지한다는 것은 사심(邪心)을 금함이로다(禁其邪也).' 이 글에서도 거문고를 통해 나쁜 마음인 사심을 금하면서 인(仁)의 마음을 함양하고자 하는 뜻을 표현하고 있다.
'악학궤범'을 편찬한 용재(용齋)성현(1439~1504)은 거문고를 좋아하고 연주도 잘했는데, 거문고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다. '나는 음을 교묘하게 하지 말고 음률을 고르자는 것이다. 음탕하고 안일할 정도로 방종하지 말고 중화(中和)의 덕을 이루려고 하네. 그저 읊고 노래하는 데 그치지 말고 가슴속의 사특하고 더러운 기운을 씻어내자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옛날 군자들이 까닭 없이는 거문고를 곁에서 떼어두지 않았던 뜻이라네."
그리고 심신을 닦는 도에 대해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 "담담하여 아무런 경영이 없고 공평하며 사심도 없고, 궁해도 불만이 없고 곤해도 주린 빛이 없고, 한가해서 생각도 수고로움도 없고, 자유로워 칭찬도 허물함도 없으며, 욕심도 사사로운 정도 없고, 옳음도 그름도 없으며, 형(形)도 상(象)도 없이 한다면 거의 도에 이르러서 지인(至人)의 영역에 들어가게 된다네.' 선비들이 거문고를 가까이 두며 사랑한 것은 사특한 마음과 나쁜 기운을 멀리해 덕이 높은 경지에 이르고자 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오능(五能)과 오불탄(五不彈)
이런 거문고인 만큼 거문고를 함부로 다루지 않고 연주하지도 않았다. 거문고를 탈 때는 연주해서는 안 되는 상황과 연주할 수 있는 조건 등 원칙을 정해놓고 지켰다. '오불탄(五不彈)' '오능(五能)'이 그것이다. 거문고 악보집인 '한금신보(韓琴新譜)'(1724)를 비롯한 옛 기록에 많이 실려 있다.
거문고 명인이자 학자인 노주(老洲) 오희상(1763∼1833)은 특히 오불탄 정신을 강조했다. 그는 거문고를 탈 때 오불탄의 원칙을 반드시 지켰다고 한다. 오불탄(五不彈)은 거문고를 연주해서는 안 되는 다섯 가지 상황을 말한다. 강한 바람이 불고 비가 심하게 올 때, 속된 사람을 대할 때, 저잣거리에 있을 때, 앉은 자세가 적당하지 못할 때, 의관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을 때이다. 반면 자세가 편안하고(坐欲安), 똑바로 볼 수 있고(視欲專), 마음이 한가하고(欲閑), 정신이 맑으며(神欲鮮), 손가락이 온전할 때(指欲堅)라야 연주에 임했다. 이를 오능(五能)이라 한다.
오희상은 '거문고의 묘함은 정신에 있지, 소리에 있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삿된 마음을 금하고 자신을 이기는 방법 중에 거문고 연주가 으뜸이라고도 했다. 이는 선비들의 공통된 생각이었다. 선비들이 거문고를 가까이 두고 즐긴 주목적은 마음의 도를 깨닫고 길러가는 데 있었던 것이다.
[동 추 거문고 이야기] <6> 선비와 거문고(하) 세상 사람 어진 이 몰라보니…오갈 데 없는 신세로다
자신의 처지 홀로 핀 난초 빗대 연주
제자들에 소리 통한 마음수양 가르쳐
성군의 대명사 中순임금 오현금 즐겨
'남풍가'로 백성들 고단함 어루만져
 |
한국의 거문고와 중국의 금(琴)은 한국과 중국 선비들의 각별한 사랑을 받은 악기다. '선비의 악기' '군자의 악기'로, 도를 이루어 가는데 필요한 수행 반려 악기로 대접받게 된 연유를 더듬어 가보면 공자는 물론 순임금에까지 이르게 된다. 선비들이 존경해 마지않는 중국 요순시대의 순임금과 춘추전국시대의 공자와 관련된 거문고(琴) 이야기를 살펴본다.
◆순임금의 남풍가
 |
순임금의 효행과 오현금 이야기를 담은 민화 '효(孝) 문자도'.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순(舜)임금은 요(堯)임금의 발탁으로 임금의 자리에 올라 선정을 펼쳤고, 중국의 전설적인 성군(聖君)이 되었다. 사마천의 '사기'에 '요임금의 인자함이 하늘과 같았고 지혜는 신과 같았다'라고 기록된 요임금과 더불어 순임금은 중국 역사 속에서 가장 이상적인 정치를 한 성군의 대명사가 되었다.
요임금이 그에게 황제의 자리를 물려주기로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그의 남다른 효제(孝悌) 정신이었다. 요임금은 그에게 두 딸을 아내로 주어 인성을 관찰하도록 했다. 순의 혼인 후에도 그 아버지와 의붓동생은 순을 죽이려는 음모를 멈추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은 부모와 동생을 원망하는 대신 그들의 죄를 자기가 짊어지기를 원했고, 무슨 일이든지 항상 자기 탓이라고 여겼다. 그런 순의 정성에 아버지와 동생이 결국 감동했다. 이후 요임금은 그를 등용해 능력을 다시 확인한 후 쉰 살에 임금의 일을 대행하게 했다.
순의 효제 정신은 '효(孝)' 문자도에도 자주 등장할 정도로 널리 알려졌다. 순임금의 효는 단순히 효라고 하지 않고 큰 효라는 의미의 '대효(大孝)'로 불리었다. 효는 유가(儒家)에서 강조하는 최고의 실천 덕목이다. 맹자는 효를 '온갖 행실의 근본'이라 여겼고, '요·순의 도리는 효제(孝悌)일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순임금은 또한 오현금을 잘 탔으며, 평소에도 즐겼다. 그는 거문고 곡 '남풍가'를 지어 직접 연주하기도 했다. 남풍가 내용은 이렇다. '훈훈한 남풍이 불어오니, 우리 백성들의 시름을 풀어줄 만하네/ 남풍이 때맞춰 불 때 우리 백성들의 재물도 넘쳐나겠구나'
순임금의 이 일화는 그림으로도 종종 그려졌다. 그가 황제의 처소인 남훈전에서 오현금(五絃琴)을 타면서 노래로 백성의 고단함을 달랜 내용을 그린 '남훈전탄금(南薰殿彈琴)'이 우리나라에 전한다. 순임금은 작곡도 잘했는데, 그가 지은 곡인 '소소(簫韶)'를 공자가 듣고 석 달 동안 고기 맛을 잊어버릴 정도였다고 한다.
순임금은 우(禹)임금에게 제위를 넘겨주며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인심은 위태롭고 도의 마음은 은미하니, 오직 정밀하게 살피고 한결같이 지켜 진실로 그 중심을 잡아야 한다(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 순임금이 우임금에게 전한 이 말은 '십육자심전(十六字心傳)'이라 부르는데, 유가(儒家)에서 금과옥조로 삼는 문구다. '윤집궐중'은 중국 베이징 자금성의 중화전(中和殿)에 걸려 있는 편액의 글귀이기도 하다. 청나라 건륭제 글씨다.
화담 서경덕은 거문고에 새긴 글 '금명(琴銘)'에서 '그것을 뜯어 조화시킴으로써(鼓之和)/ 요순시대로 돌아가며(回唐虞兮)/ 사악함을 씻어냄으로써(滌之邪)/ 자연과 융화되는 사람이 된다(天與徒兮)'라고 말했다.
◆공자의 의란조
공자가 행단(杏檀)에서 제자들을 가르쳤다는 행단고슬(杏檀鼓瑟) 고사에 거문고(琴)를 타는 공자가 등장한다. 이 고사는 '장자'에 나오는 '공자가 치유(緇惟)의 숲속에 나아가 행단에 앉아 쉴 때 제자들은 독서하고 공자는 거문고를 타며 노래했다'라고 한 데서 유래한다. 이에 근거해 북송 때 공자가 제자를 가르치던 강당 옛터에 단을 쌓고 은행나무를 심어 행단을 복원했고, 이후 행단고슬 고사는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 고사는 그림으로 그려지기도 했다.
거문고와 관련된 공자의 일화로, 행단고슬 고사와 함께 의란조 이야기가 유명하다. 공자는 생애 초반 30여 년 동안 천하를 주유하면서 72명의 제후들을 만나 왕도정치의 이념을 설파했다. 하지만 패도정치의 무력이 지배하던 전국시대에 어느 제후도 덕으로 세상을 다스리자는 공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참담한 심정으로 고향인 노나라로 향하던 공자는 어느 인적 없는 빈 골짜기에서 홀로 피어 있는 난초를 만나게 된다. 아무도 보아주는 이 없는 계곡에 홀로 핀 유란(幽蘭)의 그윽한 향기를 맡으며 공자는 깊이 탄식했다. 잡초 속에 묻혀 홀로 무성하게 핀 난초의 모습에서 자신의 처지를 느꼈기 때문이다. 공자는 외롭게 피어있는 난초에 자신의 심정을 담은 '의란조'라는 시를 짓고 거문고 곡으로 만들어 노래하며 연주했다.
의란조는 다음과 같다. '골바람 살랑대며 부니 날 흐리다가 비까지 내리고(習習谷風光陰以雨)/ 가던 길 다시 가려 하니 저 먼 들까지 배웅하네(之子于歸遠送于野)/ 어찌하여 푸른 하늘은 날 버리는가(何彼蒼天不得其所)/ 정처 없이 천하를 떠도니 오갈 데 없는 신세로다(逍遙九州無有定處)/ 세상 사람들 어둡고 마음이 막혀 어진 이를 몰라보고(世人闇蔽不知賢者)/ 세월은 빠르게 흘러가고 이 몸만 늙어가는구나(年紀逝邁一身將老)'
공자는 난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읊기도 했다. '깊은 산속 지초 난초는(芝蘭生於深林)/ 보는 사람 없다하여 향을 내지 않음이 없고(不以無人而不芳)/ 도를 닦고 덕을 쌓는 군자는(君子修道立德)/ 가난하다고 지조를 버리지 않는다(不爲困窮而敗節)'
공자는 29세 때 사양(師襄)에게 가서 거문고를 배웠는데, 거문고를 배우면서 열흘이 넘도록 한 곡만 연습했다. 사양이 그만하면 됐다고 해도 운율을 익힐 때까지 계속 연습했다. 운율을 알고 나서는 음악에 담긴 의미를 알 때까지 연습하고, 또 음악을 만든 사람됨을 알 때까지 연습했다.
거문고를 수시로 연주한 공자는 제자들에게도 거문고를 가르치고, 그 소리를 통해 그 마음상태를 평하며 깨달음을 얻도록 했다. 34세 때는 주나라 대부(大夫)로 왕실의 역법(曆法)을 주관하던 장홍을 찾아가 음악을 배웠는데, 장홍은 음악을 대하는 자세 등을 보고 공자에 대해 "예를 행하고 성인의 도를 전하며 실천하는 사람"이라며 칭찬했다.
공자가 단순히 음악 그 자체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다. 예(禮)와 악(樂)을 좋아한다고 한 공자는 음악을 통해 예를 실천하고자 했던 것이다. | 김봉규<문화전문 칼럼니스트> bg4290@naver.com
[동 추 거문고 이야기] 〈7〉줄 없는 거문고(상) 전원시인 도연명 '줄 없는 거문고' 뜯으며 마음의 소리 읊다
- 조현희
 |
거문고(琴)는 도연명에서 유래한 '줄 없는 거문고', 즉 무현금(無絃琴)의 정신이 부각되면서 선비들로부터 더욱더 사랑을 받게 되었다. 관리 생활을 했지만, 대부분의 생애를 초야에 묻혀 절개를 지키며 전원시인으로 살았던 도연명(365~427)은 중국은 물론, 동아시아 전체에서 널리 사랑받은 선비 시인이다. 도연명은 거문고를 사랑하고 연주하기도 했는데, 무현금도 곁에 두고 있었던 모양이다. 대표작으로 꼽히는 '귀거래사'를 비롯해 많은 작품을 남긴 도연명에 대해 양(梁)나라의 종영(鍾嶸)은 '시품(詩品)'에서 '고금 은일시인(隱逸詩人)의 종(宗)'이라 평가했다. 후세에도 똑같이 평가되었다.
대표작 '귀거래사' 남긴 中 대문호
관직 내려놓고 전원에 묻혀 낭만 즐겨
이백 등 후대 시인 그의 문장 추종
'무현금' 바람직한 선비 표상으로
◆도연명과 무현금
이런 도연명의 삶을 기록한 양(梁)나라 소통(蕭統·501~531)의 '도연명전'은 '도연명은 음률을 몰랐지만, 줄 없는 거문고를 늘 곁에 두고 술이 적당하게 되면 금(琴)을 어루만지며 자신의 마음을 기탁하곤 했다(淵明不解音律, 而畜無絃琴一張, 每酒適, 輒撫弄以寄其意)'라고 적고 있다.
그리고 소통은 도연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며 인격과 문학을 높게 평가했다. '연명의 문장은 일반 수준을 뛰어넘어 정채롭다. 적절하게 그리는 듯 현실을 비판하고 참된 경지에서 회포를 풀며, 아울러 굳은 정절로써 도에 안주하고 절개를 지켰으며, 스스로 농사짓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재산 없음을 걱정하지 않았다.'
이보다 앞서 도연명 사후 60년 정도 지나서 심약(沈約)이 지은 '송서(宋書)' 중 '은일열전(隱逸列傳)'에서도 도연명의 무현금에 대해 거의 같은 내용을 적고 있다. 도연명은 그의 작품이나 기록을 보면, 거문고를 전혀 연주할 줄 몰랐던 사람은 아니었다. 하지만 도연명의 고고한 삶을 표현하면서 이와 같이 표현한 후 무현금의 세계는 바람직한 선비를 표상하는 경지를 상징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도연명의 '귀거래사'에 나오는 대목이다. '돌아가리라. 교제를 그만두고 어울림을 끊어야겠다. 세상이 나와는 서로 어긋나니, 다시 수레를 메고 나가 무엇을 구하겠는가. 친척들과의 정다운 대화를 기뻐하고, 거문고와 책을 즐기면서 시름을 잊으리라. 농부가 나에게 봄이 왔다고 알리면, 장차 서쪽 밭에서 농사일을 해야겠다. 혹은 천을 두른 수레를 준비하게 하고 혹은 한 척의 배를 저어, 깊숙하게 물고랑을 찾아들기도 하고 울퉁불퉁한 길의 언덕을 지난다.'
그리고 51세에 자식들을 위해 쓴 글 '여자엄등소(與子儼等疏)'에는 '어려서 거문고를 배웠고 책을 읽었다. 조용하게 혼자 있는 것이 좋았단다. 책을 읽고 깨닫는 바가 있으면 너무 기뻐 밥 먹는 것조차 잊었단다. 잎사귀 무성한 나무와 나무 그늘을 보거나 때맞추어 새들이 날아와 지저귀면 마음이 절로 들뜨기도 했단다'라는 구절이 있다. 이를 보면 거문고 연주를 배워 연주할 줄도 알았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물론 거문고를 직접 연주하며 즐기는 것보다는 그 너머의 세계에 더 의미를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도연명은 줄 없는 거문고를 지니고 수시로 거기에 마음을 실어 달래면서, 스스로도 '다만 거문고가 지닌 아취를 알면 그뿐이지, 어찌 수고롭게 줄을 튕겨 소리를 낼 것인가(但識琴中趣 何勞絃上聲)'라고 이야기했다. 이처럼 거문고를 곁에 두고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그 소리를 즐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며 깨달음을 얻는 데 있었다.
실학자 성호(星湖) 이익(1681~1763)은 도연명을 사모하는 친구를 위해 지어준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내가 일찍이 듣건대, 한(漢)나라 제갈후(諸葛侯)가 은거할 때에는 무릎을 끌어안고 휘파람을 불고 칠현금(七絃琴)을 연주하며 평생을 마칠 것처럼 지내다가, 고기가 물을 만나듯 자신을 알아주는 주군을 만나자 우뚝이 삼분천하(三分天下) 하는 공업을 이루었다. ~ 저 도연명 또한 제갈량을 사모한 자였기에 깊이 좋아하는 뜻을 자신의 이름에 드러내고서 마침내 무현금(無絃琴)을 두고 그에 회포를 부쳤으니, 아마도 제갈량과 같은 체(體)를 가지고 있었으나 쓰임이 없었던 것이리라. 이제 그대가 도연명을 좋아하는 것이 도연명이 제갈량을 좋아했던 이유이니, 이것으로 충분히 다할 수 있을 것이다. 내 벗은 힘쓸지어다.'
◆'무현금'에 대한 중국인들의 찬사
도연명 별세 후 많은 이들이 그의 무현금에 대해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며 찬사를 보냈다. 그중 먼저 당나라 시인 이백(701~7620)의 시 '희증정율양(戱贈鄭栗陽)'이다.
'도연명은 날마다 취해서/ 다섯 그루 버드나무에 봄이 온 줄 모르네/ 꾸미지 않은 거문고엔 본래 줄이 없고/ 술을 거를 때는 칡베 두건을 쓰네/ 맑은 바람 불어오는 북쪽 창문 아래에서/ 스스로 복희 황제 때의 사람이라 말하네/ 언제나 율리에 가서/ 평생 가까이 했던 벗을 한번 만나 볼는지'
도령(陶令)은 도연명이 팽택령(彭澤令) 벼슬을 지냈다 하여 칭한 말이다. 오류(五柳)는 도연명이 자신의 집 문 앞에 다섯 그루의 버드나무를 심어놓고 스스로 '오류선생(五柳先生)'이라 일컬었던 데서 유래한다.
그리고 도연명은 여름철 한가로울 때에 북쪽 창 아래에 눕고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자 스스로 희황상인(羲皇上人)이라 칭하였다고 한다. 희황은 중국 고대의 전설상의 삼황(三皇)의 한 사람이자 상고 시대의 제왕인 복희씨(伏羲氏)를 가리킨다. 중국인들은 복희씨가 살던 상고 시대야말로 이상적인 정치가 행해지던 때라 믿어서 이런 표현을 쓴 것이다. 율리(栗里)는 도연명이 살던 마을로, 여기서는 시인의 친구가 현령으로 있는 율양을 이야기한다.
백거이(772~846)는 '구중유일사(丘中有一士)'라는 시를 남겼다. '산 속에 사는 한 선비(丘中有一士)/ 도를 지키며 오랜 세월 보냈네(守道歲月深)/ 걸을 때는 새끼로 맨 옷을 입고(行披帶索衣)/ 앉아서는 줄 없는 거문고 타네(坐拍無絃琴)/ 흐린 샘물은 마시지 않고(不飮濁泉水)/ 굽은 나무 그늘에는 쉬지를 않네(不息曲木陰)/ 티끌만큼이라도 의에 맞지 않으며(所逢苟非義)/ 천 냥의 황금도 흙보다 못하게 여기네(糞土千黃金)/ 마을 사람들 그 기풍 따르니(鄕人化其風)/ 난초 숲에 있는 듯 향기가 나네(薰如蘭在林)/ 지혜롭든 어리석든 강하든 약하든(智愚與强弱)/ 서로 속이고 괴롭히는 일 없었네(不忍相欺侵)/ 그 선비 찾아가 보고 싶어(我欲訪其人)/ 만나러 가려 하다 다시 생각하네(將行復沈吟)/ 그 얼굴 꼭 봐야만 하겠는가(何必見其面)/ 그 마음 제대로 배우면 될 일이지(但在學其心)'
이런 시에서 알 수 있듯이 도연명 이후 많은 중국 선비들이 그의 무현금의 정신세계를 인용하는 가운데, 도연명의 삶을 사랑하며 이상적인 선비의 삶을 추구하고 있다. 한국의 선비들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동 추 거문고 이야기]〈8〉줄 없는 거문고(하) 정신은 찾지 않고 껍데기만 좇을 뿐…고요함 속 찾은 깨달음의 경지
- 조현희
 |
"옛말에 이르기를 거문고는 악(樂)의 으뜸이라, 군자가 항상 사용하여 몸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나는 군자가 아니지만 거문고 하나를 지니고 줄도 갖추지 않고서 어루만지며 즐겼더니, 어떤 손님이 이것을 보고 웃고는 다시 줄을 갖추어 주었다. 나는 사양하지 않고 받아서 길게 혹은 짧게 타며 마음대로 가지고 놀았다. 옛날 진나라 도연명은 줄이 없는 거문고를 두고 그것으로 뜻을 밝힐 뿐이었는데, 나는 이 구구한 거문고를 가지고 그 소리를 들으려 하니 어찌 옛 사람을 본받겠는가?"
시·거문고·술을 너무나 좋아해 '삼혹호선생(三酷好先生)'이라는 호를 스스로 지었던 이규보(1168~1241)가 남긴 내용이다. 그 역시 도연명의 무현금의 세계를 동경했음을 알 수 있다. 줄 없는 거문고 '무현금'의 세계는 이처럼 한국의 선비들에게도 깊이 스며들었다.
소리가 없음에 느끼는 오묘함 체득
귀한 줄이나 채 가져도 부질 없는 것
귀로 듣는게 아닌 마음으로 듣는 것
선비들에 깊이 스며든 무현금 세계
◆조선의 선비와 무현금
이규보는 도연명의 무현금 세계를 찬미하는 시를 적지 않게 남겼다. 다음은 도연명의 시에 대해 읊은 작품 '독도잠시(讀陶潛詩)'이다. 도잠(陶潛)은 도연명의 본명이다. 연명(淵明)은 도잠의 아호이다. '내가 사랑하는 도연명은(吾愛陶淵明)/ 그 말이 너무도 평담하다(吐語淡而粹)/ 항상 줄 없는 거문고 어루만졌다지(常撫無絃琴)/ 그러기에 시도 모두 그렇구나(其詩一如此)/ 지극한 음률은 소리가 없는 법이니(至音本無聲)/ 무슨 줄이 필요하겠는가(何勞絃上指)/ 지극한 말은 문체가 없는 법인데(至言本無文)/ 어찌 꾸밈을 일삼으랴(安事彫鑿費)/ 자연에서 나온 그 평화로운 말들(平和出天然)/ 음미할수록 진미를 느끼네(久嚼知醇味)/ 인끈 풀고 전원에 돌아와(解印歸田園)/ 세 갈래 좁은 길 소요하면서(逍遙三徑裏)/ 술 없으면 친구 찾아가(無酒亦從人)/ 날마다 취해 쓰러졌지(頹然日日醉)/ 한 평상에 희황이 누웠으니(一榻臥羲皇)/ 맑은 바람 솔솔 불어온다(淸風颯然至)/ 순수한 태고 시절 백성이요(熙熙太古民)/ 고상하고 뛰어난 선비로세( 卓行士)/ 그 시 읽고 그 사람 상상하며(讀詩想見人)/ 천년토록 높은 의리 숭앙하리(千載仰高義)'.
이규보의 또 다른 시 '소금(素琴)'이다. '천뢰(우주)는 처음부터 소리 없는데/ 흩어져 만규(萬竅)의 소리를 내는구나/ 오동은 본래 고요한 것이나/ 다른 힘을 빌려서 소리가 나네/ 내가 줄 없는 거문고로/ 유수(流水)곡 한 곡을 타네/ 지음(知音)이 듣기를 원하지도 않고/ 속물이 듣는 것도 꺼리지 않네/ 다만 내 마음을 쏟아/ 애오라지 한두 줄 퉁겨 보네/ 곡조가 끝나면 또 고요하게 침묵하니/ 아득히 옛사람의 뜻과 합치되네'
화담(花潭) 서경덕(1489~1456)은 '무현금명(無絃琴銘)'을 남겼다. 무현금의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다. '거문고에 줄이 없는 것은(琴而無絃)/ 본체는 놓아두고 작용을 뺀 것이다(存體去用)/ 정말로 작용을 뺀 것이 아니라(非誠去用)/ 고요함에 움직임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다(靜基含動)/ 소리를 통하여 듣는 것은(聽之聲上)/ 소리 없음에서 듣는 것만 같지 못하며(不若聽之於無聲)/ 형체를 통하여 즐기는 것은(樂之刑上)/ 형체 없음에서 즐기는 것만 같지 못하다(不若樂之於無刑)/ 형체가 없음에서 즐기므로(樂之於無刑)/ 그 오묘함을 체득하게 되며(乃得其)/ 소리 없음에서 그것을 들음으로써(聽之於無聲)/ 그 미묘함을 체득하게 된다(乃得其妙)/ 밖으로는 있음에서 체득하지만(外得於有)/ 안으로는 없음에서 깨닫게 된다(外得於無)/ 그 가운데에서 흥취 얻음을 생각하면(顧得趣平其中)/ 어찌 줄에 얽매이겠는가(爰有事於絃上工夫)/그 줄은 쓰지 않고(不用其絃)/ 그 줄의 줄 소리 밖의 가락을 쓴다(用其絃絃律外官商)/ 나는 그 본연을 체득하고(吾得其天)/ 소리로써 그것을 즐긴다(樂之以音)/ 그 소리를 즐긴다지만(樂其音)/ 소리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요(音非聽之以耳)/ 마음으로 듣는 것이다(聽之以心)/ 저 종자기가(彼哉子期)/ 어찌 나의 거문고 소리를 귀로 들으리(曷耳吾琴)'
종자기(鍾子期·BC 387~299)는 중국 춘추전국 시대 초나라의 사람이다. 거문고의 명인 백아(伯牙)의 거문고 소리를 종자기만 제대로 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 두 사람은 서로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고, 종자기가 죽은 후에 백아는 지음(知音)을 잃었다고 탄식하며 거문고를 다시 연주하지 않았다고 한다.
조선 전기 문신인 이영서(?~1450)가 남긴 시 '무현금(無絃琴)'이다. 여기에서도 이런 선비의 삶을 잘 읽을 수 있다. '도연명이 거문고 하나를 가졌는데(淵明自有一張琴)/ 줄을 매지 않았지만 뜻은 더욱 심오했었네(不被朱絃思轉深)/ 참된 맛을 어찌 거문고 소리로써 얻을 것인가(眞趣豈能聲上得)/ 천기란 모름지기 고요함 속에서 찾아진다네(天機須向靜中尋)/ 좋은 거문고 줄과 채는 모두 부질없는 것(鯤絃鐵撥渾閑事)/ 유수와 고산을 켰다는 악곡도 헛애만 쓴 것이네(流水高山 苦心)/ 옛 거문고 가락 속인의 귀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을 것이니(古調未應諧俗耳)/ 천년 세월이 흘러가도 그 곡조 아는 이 없으리(悠悠千載少知音)'
'곤현(鯤絃)'은 곤어(鯤魚) 가죽으로 만든 줄로, 좋은 거문고 줄을 의미한다. 곤어는 북해에 산다는 상상의 큰 물고기이다. 그리고 '철발(鐵撥)'은 쇠로 만든 채(현을 퉁기는 도구)를 말한다. 좋은 악기나 연주 도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리 이전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것이 관건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줄이 없는 거문고는 보통 사람들에게는 쓸모가 없는 물건에 불과하다. 하지만 도연명은 무현금 하나를 가지고 어루만지면서 심오한 뜻을 추구했다. 참다운 맛은 거문고에서 나오는 소리로 얻어지는 게 아니며, 귀한 거문고 줄이나 채를 가졌다는 것은 다 부질없는 것이다. 백아가 아양곡을 잘 타고 종자기가 그 가락을 잘 알아들었다는 것도 헛애만 쓴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도연명이 줄 없는 거문고에서 들었던 그 곡조를 알고자 하는 뜻을 드러내고 있다.
동양의 대표적 고전인 '채근담'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다. '세상 사람들이 고작 유자서(有字書)나 읽을 줄 알았지 무자서(無字書)를 읽을 줄은 모르며, 유현금(有絃琴)이나 뜯을 줄 알았지 무현금(無絃琴)을 뜯을 줄은 모르니, 그 정신을 찾으려 하지 않고 껍데기만 쫓아다니는데 어찌 금서(琴書)의 참맛을 알 도리가 있겠는가.' 이처럼 선비들, 군자와 성인이 되고자 했던 옛 지식인들은 그들이 추구한 인격을 완성해 가는 동반자로 무현금을 가까이했던 것이다.
무현금의 세계를 추구한 것은 선비들뿐만이 아니다. 선사들, 불교 수행자들은 '몰현금(沒絃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깨달음의 경지를 드러내고 있다. 줄 없는 거문고라는 비유를 통해 탐진치(貪嗔痴)를 벗어난 깨달음의 세계, 진공묘유(眞空妙有)의 경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 김봉규 <문화전문 칼럼니스트> bg4290@naver.com
[동 추 거문고 이야기] 〈9〉형체 없는 거문고
- 김봉규 문화전문 칼럼니스트
조선 중기 대구부사 지낸 김윤안
도연명 詩 지극히 사랑했던 인물
줄 없는 무현금 즐긴 도연명 넘어
마음 속의 거문고로 근심 씻어내
 |
'줄 없는 거문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형체 없는 거문고'를 이야기한 선비가 있다. 안동(풍산) 출신으로 대구부사를 지낸 동리(東籬) 김윤안(1560~1622)의 '무형금(無形琴)'이다. 그는 도연명에게 줄 없는 거문고(無絃琴)가 있었다면 자신에겐 형체 없는 거문고(無形琴)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김윤안은 작은 초당을 하나 마련한 뒤 적은 글 '소우당기(消憂堂記)'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어려서부터 매우 가난하였는데 늘그막에 구산(龜山) 아래에 집을 빌려 살았다. 집 둘레는 휑하여 바람과 햇빛조차 가릴 수 없었다. 손님이 오면 늘 마당에 앉아서 맞았다. 10년을 경영하여 초당 한 채를 지었는데, 한 해가 가고서야 완성할 수 있었다. 초당은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정면에 산봉우리가 우뚝 솟아 있다. 초당에는 빈 땅이 없어서 대나무나 꽃 따위를 심을 수 없었다. 다만 국화 몇 포기가 있어서 때가 되면 피었다. 창은 '남창'이라 하고, 뜰은 '면가(眄柯)'라 하고, 문은 '상관(常關)'이라 불렀다. 초당 동쪽에 나지막한 울타리가 있었는데 '동리(東籬)'라 하였다. 이 모두를 합한 초당의 이름을 '소우당(消憂堂)'이라 하였다. 모두 도연명의 말에서 가져온 것이다. 근심은 마음의 병이다. 풀어서 없어지게 하여 즐겁게 된다면, 천지 만물이 모두 나의 즐거움이 될 것이다. 어떤 손님이 물었다. '사모할 만한 옛 성현이 한둘이 아닌데 그대는 초당의 창, 문, 뜰, 울타리를 모두 도연명의 말에서 가져와 이름 붙였소. 그대는 어째서 오로지 도연명만 별나게 흠모하시오?'
내가 말했다. '그를 흠모하는 게 아니라 우연히 그와 같았을 뿐이오. 내가 가난한 것이 도연명과 같고, 초당에 책이 있는 것이 도연명과 같고, 남쪽에 창이 있고 동쪽에 울타리가 있는 것이 도연명과 같고, 문이 늘 잠겨 있어서 쓸쓸한 것이 도연명과 같소이다.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지 구차하게 흠모하는 것이 아니라오.' 손님이 또 말했다. '그대의 말은 그럴듯하오. 도연명은 거문고(琴)와 책을 즐기며 근심을 씻는다고 하였는데, 그대의 초당에는 책은 있으나 거문고가 없으니 어찌 된 일이오?' 내가 '도연명은 줄 없는 거문고인 무현금(無絃琴·원 안)을 가졌고 나는 형체 없는 거문고인 무형금(無形琴)이 있으니, 어찌 거문고가 없다고 하시오'라고 대답했다. 손님이 웃으면서 떠나갔다."
김윤안은 이 기문에서 도연명의 '무현금'을 넘어 '무형금'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다. 줄 없는 거문고가 아니라, 아예 거문고 자체가 없이 거문고의 세계에 노닐 것을 꿈꾸고 있다.
◆도연명을 흠모한 김윤안의 '무형금'
김윤안의 호 동리(東籬)는 도연명의 시에서 따와 스스로 아호로 삼은 이름이다. 김윤안은 이 글에서 보듯이 초당의 창과 문, 울타리, 뜰의 이름을 모두 도연명의 시 구절에서 따올 정도로 도연명을 지극히 사랑한 인물이다. 김윤안은 소고 박승임, 겸암 류운룡, 서애 류성룡, 학봉 김성일 등의 문하에서 학문을 배웠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는 의병에 참여하여 김해(金垓)의 막하에서 문서 수발을 도맡았고, 영남 유생들이 회재 이언적을 변호하고 오현(五賢)의 문묘 종사 운동을 할 때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선조 후반과 광해군 때 관직에 나아가기도 하였지만, 대구부사를 마지막으로 귀향해 소우당을 짓고 은거했다.
많은 선비들이 도연명을 사모하고 그의 시풍을 본받으려 했다. 퇴계 이황은 도연명의 시를 읽고 맛을 보면 속세의 먼지를 털어 버리고 만물 가운데 홀로 초탈하게 서 있는 느낌을 준다고 이야기했다. 김윤안은 류운용과 류성룡 등을 통해 이황의 학맥을 이었다. 도연명은 열심히 공부해서 벼슬길로 나아가 이상적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뜻을 펼칠 상황이 안 되면 미련 없이 물러나는 출처진퇴(出處進退)의 모범을 보인 상징적인 인물이다. 김윤안은 소우당 곳곳에 도연명의 시 구절을 끌어들여 자신이 살고자 하는 삶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서 형체마저도 없는 무형금을 이야기하고 있다. 마음을 잘 다스리고 단속할 힘이 충분하다면 유현금이나 무현금 모두 필요 없을 것이다. 마음속에 무형금 하나만 있으면 언제든 탈 수 있을 것 아닌가.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조선 후기 문신인 귀와(龜窩) 김굉(1739~1816)은 1811년 12월 동리선생문집 발문(跋文)에서 김윤안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다. '동리(東籬)라는 자호(自號)로 집에 편액을 단 뜻은 도연명의 풍류를 듣고서 흥기한 것이다. 바야흐로 그 남창에 기대어 노닐고 동쪽 언덕에서 시를 읊조리며, 거문고와 책을 통해 온갖 근심을 없애고, 구름과 새에게 한가한 심정을 부치고, 소나무 오솔길을 거닐고 국화꽃을 따며 지냈다. 그 그윽한 운치와 구함이 없는 뜻은 시대는 달라도 흥취는 같으니, 천년 세월이 아침저녁이라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찌 선생이 다만 그 적적하고 한가한 취미를 좋아해서 아름다운 겉모습만 표방하고자 한 것이겠는가. 아마도 반드시 분발한 바가 있어 뜻을 부친 것이 그 사이에 있을 것이다.'
김윤안은 54세 때인 1613년 봄부터 1615년 겨울까지 대구부사로 재임했는데, 당시 대구시 달성군 하빈면 묘리에 있는 태고정(太古亭)을 위해 시를 한 수 남겼던 것 같다. 태고정은 사육신 중 한 사람인 박팽년(1417~1456)의 절의를 기리기 위해 그의 손자인 박일산이 1497년에 처음 건립한, 사당인 절의묘(節義廟)가 딸린 종택의 별당 건물로 지은 정자다. 지금 건물은 임진왜란 때 불타고 일부만 남은 것을 1614년에 다시 지은 것이다. 김윤안은 1614년 태고정이 재건된 후 이 정자를 찾아 시를 남겼을 것으로 보인다. 태고정에 오르면 김윤안의 시판이 걸려 있다.
'정자 이름이 어찌하여 태고인고(亭名何太古)/ 주인의 마음이 태고라네(主人心太古)/ 원컨대 태고의 마음으로(願得太古心)/ 일마다 모두 태고이기를(事事皆太古)'. '태고'를 구절마다 사용해 지은 시다. 이 시 현판의 글씨는 전서로 되어 있는데, '태고(太古)' 글자 모두를 각기 다른 전서로 써서 눈길을 끈다.
[동 추 거문고 이야기] 〈10〉탁영금(濯纓琴)
- 김봉규 문화전문 칼럼니스트
 |
탁영금(濯纓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거문고의 이름이다. 탁영(濯纓) 김일손(1464~1498)이 1490년에 만들어 타던 것으로,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다. 탁영종가(종손 김상인)의 소유인 이 거문고는 대구국립박물관에 기탁되어 있다. 거문고 윗면 중앙에 '탁영금(濯纓琴)'이라고 새겨져 있고, 한쪽 끝부분에 학이 그려져 있다. 뒷면에는 김일손이 지은 시가 새겨져 있다. 길이 160㎝, 너비 19㎝, 높이 10㎝.
절의를 대표하는 선비로 존경을 받는 김일손은 자신이 사관으로 재직할 때 스승인 김종직의 '조의제문(弔義帝文)' 등을 사초(史草)에 실어 촉발된 무오사화(1498년)로 능지처참의 형을 당했다. 왕의 총애 속에 요직을 거친 그는 거문고에도 조예가 깊었다. 사가독서(賜暇讀書) 시절, 독서당에서 여러 선비와 더불어 전문가에게 거문고를 배우기도 했다. 그가 어느 집 대문짝을 구해 만든 탁영금은 약 450년이 지난 뒤 당시 탁영종가 종손(김헌수)이 전북 완주의 어느 집에 소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종손이 그 집을 찾아가 간곡히 부탁하고 설득해 거문고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다. 종손은 거문고를 가져온 후 1979년 청도의 탁영종택 사당에 고유하고, 그 전말을 담은 비석 '탁영금(濯纓琴)'을 사당 앞마당에 세웠다. 이후 탁영종가는 탁영금을 문화재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했으며, 1988년에 보물로 지정받게 되었다.
거문고 윗면에는 김일손 사후에 옥강(玉岡)이라는 선비가 탁영 김일손의 거문고라는 사실을 밝히는 글을 전서로 새겨 놓았다. 뒷면에는 김일손이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글이 새겨져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가의 가르침은 쉽게 다하고/ 불가의 가르침도 마침내 마르지만/ 우리 유가의 신비한 뜻은/ 아무리 써도 시들지 않네/ 이 거문고는/나의 약하게 가라앉은 마음을 북돋우고/ 나의 삼가고 조심하는 마음을 굳건히 하는 것이로다.' 김일손은 탁영금에 대한 내력을 담은 글인 '서육현배(書六絃背)'를 비롯해 거문고 관련 시와 글을 여러 편 남기고 있다.
청도 종택 사당에 탁영금 비석 세워
김일손 詩·탁영종택 소장 경위 새겨
보물로 지정, 대구국립박물관 기탁
거문고 간직, 사람의 성정 다스려
中에는 없는 '괘'로 오현금 만들어
내면으로 옛 것 따르고 마음 단속
 |
◆김일손의 '육현금 뒷면에 쓰다(書六絃背)'
'옛사람이 흔히 거문고를 만들어 간직한 것은 거문고로 사람의 성정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순(舜)임금은 오현을 썼고, 문왕(文王)은 칠현을 썼으니 육현은 옛 법이 아니다. 진(晉)나라에서 칠현금을 고구려에 보내오자 국상 왕산악이 그 거문고를 개조하여 육현으로 만들어 지금도 쓰고 있는 것이며, 신라에 전해져서 극종(克宗)이란 사람이 평조(平調)와 우조(羽調)의 가락을 작곡하여 육현에 맞추었다고 한다. 육현은 지금도 사용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 육현은 그 역사가 오래되었다 하겠다.
계축년(1493) 겨울에 나는 신개지, 강사호, 김자헌, 이과지, 이사성과 더불어 교대로 독서당에서 공부하면서 여가에 거문고를 배웠다. 권향지도 홍문관에서 때때로 내왕하여 배우면서 말하기를 "여러 군자는 옛것을 좋아하면서 어찌하여 오현이나 혹은 칠현을 쓰지 않는가"라고 하였다. 내가 "지금의 음악은 옛날 음악에 말미암은 것이다. 소강절(昭康節)이 옛날 옷인 심의(深衣)를 입지 않고, 요즘 사람은 당연히 요즘의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취하였다"라고 답했다. 권향지는 또 "왕산악이 육현을 타는데 검은 학이 날아와서 춤을 추어서 이름을 현학금(玄鶴琴)이라 하였고, 그 뒤에 학(鶴)자를 생력하고 현금이라고 하였다. 거문고 하나에 학 한 마리가 짝을 이루는데 이 거문고는 외짝일세"라고 말했다. 이에 내가 이렇게 말했다. "학은 먹을 것을 생각하는데 거문고는 먹지 않고, 학은 욕심이 있는데 거문고는 욕심이 없으니, 나는 욕심 없는 것을 따르겠다. 그러나 그림의 학은 욕심이 없을 것이니, 나는 장차 거문고에 학을 그려서 그 무리를 따를 것이다."
그리고 용헌 거사 이종준에게 학을 그려 달라고 청하였다. 평소 거문고를 만들어 비치해 두고자 하였으나 재목을 구하기가 어려웠다. 어느 날 동화문(東華門) 밖에 있는 한 노파의 집에서 얻으니 바로 사립문 문설주였다. 노파에게 그 재목이 오래된 것이냐고 물었더니 노파의 말이 "대략 100년 되었는데 한쪽 지도리는 부서져 벌써 밥 짓는데 사용했다"고 하였다. 거문고를 만들어 타보니 소리는 맑은데, 월(越·거문고 밑바닥에 있는 구멍)과 빈지(賓池)에 아직도 사립문을 만들었을 때의 못 구멍이 셋이나 있으므로 우연히 옛날 초미금(焦尾琴)과 다를 바가 없게 되었다. 이에 월의 오른쪽에 새길 글을 이렇게 짓는다. 물건이란 외롭지 않아서 마땅히 짝을 만나게 되지만(物不孤 當遇匹), 백세의 긴 세월이 멀어지면 혹 기필하기 어렵다네(曠百世 惑難必). 아, 이 오동나무는 나를 잃지 않았도다(噫此桐 不我失). 서로가 기다린 것이 아니라면 누굴 위해서 나왔겠는가(非相待 爲誰出).'
◆'오현금 뒤에 쓰다(書五絃背)'
'나는 이미 육현금을 만들어 독서당에 두고 또 오현금을 만들어 집에 두었다. 그 길이는 석 자요, 너비는 여섯 치로 하였다. 요즘의 자를 써서 옛 모양을 취한 것이다. 육현에서 하나를 빼고 다섯으로 한 것은 복잡함을 덜자는 것이요, 16괘에서 넷을 빼고 12괘로 한 것은 역시 복잡을 덜어서 12율(律)을 보존하자는 것이다. 줄이 다섯인지라 세 줄은 괘 위에 있고 두 줄은 괘 곁에 있으며, 괘는 오동나무 공명통 복판에 바르게 고정되어 기울거나 바른 상태를 잃지 않는다. 괘라는 것은 방언(方言)이다. 이는 비록 옛 제도에 전부 부합한다고는 못하겠지만, 또한 옛 제도와 크게 어긋나지도 않는다. 남풍(南風, 순임금이 지었다는 남풍가)을 연주하니, 소리가 청아하여 태고 시절에 남긴 음률과 같았다. 손님이 "육현금은 독서당에 공개하고 오현금은 집안에 두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라고 묻기에, 내가 "외양으로는 지금의 것을 따르나, 내면으로는 옛것을 따르고자 함이다"라고 대답했다.' 김일손이 오현금을 만들고 난 뒤 쓴 이 글을 보면, 그가 만든 오현금에는 중국 금(琴)에는 없는 괘가 있어 순임금의 오현금보다는 우리나라의 거문고에 더 가까운 듯하다.
김일손은 '오현금명(五絃琴銘)'이라는 시도 남겼다. '재목도 좋다마는/ 만든 솜씨도 훌륭하다/ 거문고 줄 매워/ 내 서당 위로 올라와서/ 남풍가를 연주하니/ 순임금 가락이 담긴 듯하네'.
거문고를 얹어 두는 시렁을 만든 후 지은 '금가명(琴架銘)'도 전한다. '거문고는 내 마음을 단속하는 것이라 시렁을 만들어 높이는 것이니 소리가 좋기 때문만은 아니다.'
[동 추 거문고 이야기] 〈11〉 강세황과 거문고
- 김봉규 문화전문 칼럼니스트
 |
시·서·화 모두에 뛰어난 문인이자 화가였던 표암(豹菴) 강세황(1713∼1791). 남달리 높은 식견과 안목을 갖춘 사대부 화가이면서 서화 비평 활동을 겸해, 당시 화단에서 '예원(藝苑)의 총수'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그다. 특히 한국적인 남종문인화풍(南宗文人畵風)의 정착에 크게 기여하였다. 진경산수의 발전, 풍속화·인물화의 유행, 새로운 서양 화법의 수용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 그는 김홍도와 신위에게 그림을 가르친 스승이기도 하였다.
◆산수화와 거문고로 심신을 달랜 강세황
강세황은 거문고도 매우 사랑했는데, 널리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 문인들이 거문고를 배우고 틈틈이 연주하며 '문예일치(文藝一致)'를 추구한 예가 드물진 않지만, 그가 거문고를 좋아하게 된 동기와 거문고를 즐긴 사연은 좀 특별하다. 강세황은 '산향재(山響齋)'라는 아호도 사용했다. 이는 젊은 날 자신의 서재에 '산향재(山響齋)'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시작됐다. 중국 남북조 시대의 화가 종병(宗炳·374~443)의 글에서 따온 것이다. 종병은 글과 음악에도 조예가 깊은 화가였다. 그는 늙고 병들면 명산을 둘러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 유람했던 곳의 산수를 모두 그림으로 그려 방에 걸어두고 '금(琴)을 연주하여 그림 속의 모든 산에 메아리치게 하겠다(撫琴動操 欲令衆山皆響)'라고 이야기했다. 종병의 이런 생각과 실천은 '와유(臥遊·누워서 그림 보며 유람한다는 의미)'라는 예술 철학을 낳았고, 후대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종병의 글을 읽으며 자신도 그렇게 하고 싶었던 강세황은 이 이야기 중에서 '산향(山響)'을 가져와 서재 이름으로 삼았다.
강세황은 또 당송대의 문인 구양수(歐陽脩·1007~1072)가 '거문고를 배워서 즐기니 병이 내 몸에 있는 것을 모르겠다'라고 한 글에도 마음이 끌렸다. 그래서 '거문고에 뜻을 두어서 그 조용하고 담박한, 깊고 먼 소리를 얻어서 마음과 뜻을 평화롭게 하고 우울한 것을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어릴 적부터 몸이 허약하여 마음대로 나다니지 못하고 좋아하는 산수 그림으로 목마름을 달래던 강세황은 종병과 구양수의 글에서 힘을 얻어 거문고를 익혔던 것이다.
강세황은 서재 네 벽에 모두 산수를 그려 붙이고 그 속에서 거문고를 연주하곤 했다. 그는 '그림 속의 여울물이 돌에 부딪히는 소리, 약한 바람이 솔 사이로 들어오는 소리, 고기잡이 어부의 노랫소리, 벼랑에 붙은 절간의 저녁 종소리, 숲 사이에서 우는 학 소리, 물속에서 울부짖는 용의 소리들이 거문고 소리와 완전히 어울려 그림이 그림인지, 거문고가 거문고인지 알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병을 잊어버리고 소원도 풀게 되어, 마음이 평화로워져서 우울증도 없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다. 강세황은 25세 때(1737년) 이런 내용이 담긴 글 '산향기(山響記)'를 썼다. 한양 남대문 밖 염천교 근처인 처가의 빈집으로 이사한 후 자신의 작은 서재를 '산향재'라 하고, 이곳에서 그림을 감상하고 거문고를 연주하면서 소일했다. 몇 해 후인 1744년, 강세황은 가정형편이 더 어려워지자 아예 처가 동네인 경기도 안산으로 이주하여 30여 년 동안 살게 되었다. 이곳에서도 역시 그림과 거문고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 그는 안산에서 처가의 인척들뿐만 아니라 여주이씨 집안의 문인 등과 '시서화금주기(詩書畵琴酒碁)'로 교유했고, 그의 그림과 음악 취미는 더욱 경지가 높아져 갔다.
높은 식견과 안목 갖춘 사대부 화가 표암
남종문인화 토착화·서양화법 수용 기여
당대 선비 가장회 모습 담은 '현정승집도'
청문당서 음악과 술에 취해 시름 털어내
◆강세황이 그린 '현정승집도(玄亭勝集圖)'
강세황의 거문고는 1747년 그가 그린 '현정승집도(玄亭勝集圖)'에도 나타난다. 현정승집도는 안산 현곡(玄谷)의 청문당(聽聞堂)에서 있었던 '복날 모임'을 그린 작품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초복 다음 날 청문당에 모여서 가장(家獐· 개장국)을 먹고 거문고 연주와 노래를 감상하며 술을 마시고 시를 지으면서 놀았다. 11명이 참석한 이날의 복달임 구성원은 강세황과 그의 처가 인척들(유경종, 유경용, 유성), 강세황의 두 아들(강인, 강완) 등이었다. 이 그림의 거문고 옆에 앉아 오른쪽으로 시선을 보내고 있는 이가 강세황이다.
유경종이 '현정승집도' 그림 옆에 모임을 설명하는 글을 남겼는데, 그날의 상황이 잘 나타나 있다. '복날에는 가장회(家獐會)를 하는 것이 풍속이다. 정묘년 6월 1일이 초복이었으나, 이날 마침 일이 있어 다음 날로 미루어 현곡(玄谷)의 청문당에서 모임을 열었다. 술이 거나해지자 광지(光之·강세황)에게 그림을 부탁하여 훗날의 볼거리로 삼고자 하였다. 모인 사람은 대개 11명이었다. 방안에 앉은 사람이 덕조(德祖·유경종), 문밖에 책을 들고 마주 앉은 사람이 유수(有受), 가운데 앉은 사람이 광지, 옆에 앉아 부채를 부치는 사람이 공명(公明), 마루 북쪽에서 바둑을 두는 사람이 순호(醇乎), 갓을 벗은 채 머리를 드러내고 대국하는 사람이 박성망, 그 옆에 앉아있는 자가 강우(姜佑), 맨발인 사람이 중목(仲牧)이다. 동자(童子) 두 사람 중 책을 읽고 있는 자가 경집(慶集), 부채를 부치고 있는 자가 산악(山岳)이다. 대청마루 아래에 시립하고 있는 자는 집안의 일꾼 귀남이다. 이때 장맛비가 막 걷히고 초여름 매미 소리가 들려왔다. 거문고와 노랫소리가 번갈아 일어나는 가운데, 술 마시고 시를 읊으며 피곤함을 잊으니 그 흥취가 족히 즐길 만했다. 그림이 완성되므로 덕조가 기문을 짓고, 모든 이들이 각기 시를 지어 이 아래 붙인다.'
강세황도 이때 시 한 수를 지어 붙였다. '탁 트인 산 위 누각엔 술잔이 널려 있고/ 졸졸 흐르는 시내가 난간까지 닿았네/ 거문고 가락 솔바람 따라 멀리 흩날리고/ 맑은 날 우박 치듯 바둑돌 소리 차갑구나/ 내키는 대로 시를 읊조리며 다투어 화답을 재촉하고/ 세세히 옮긴 그림 서로 다퉈 돌려 보네/ 촛불 잡고 흠뻑 취하기를 사양하지 마시게/ 흐르는 세월 쏜살같다 애석해 하랴'. 이런 생활 속에서 강세황은 거문고로 마음을 달래며 보냈다. 그에게 거문고는 각별한 동반자였던 것이다.
이듬해인 1748년에 강세황이 그린 두루마리 작품 '지상편도((池上篇圖)'에도 거문고가 등장한다. 당나라 시인 백거이(白居易)의 '분수를 알고 만족할 줄 아는 삶 속에서 늙어가겠다'는 심정을 노래한 '지상편(池上篇)'이라는 시를 소재로 삼은 그림이다. 서책과 거문고가 놓인 방에 선비 한사람이 앉아있는 작품이다.
[동 추 거문고 이야기] <12〉 강세황과 거문고
- 김봉규 문화전문 칼럼니스트
 |
강세황(1713~1791)은 70대의 나이에 청나라 사신의 일행으로 중국 베이징에 갔을 때 많은 현지인들이 그의 그림을 구하려 할 정도로 유명했던 화가였지만, 과거시험 장원급제(66세 때) 후 예조판서까지 지낸 문인 관료이기도 했다. 문인 출신이지만 글씨와 서화에 능해 한국화 역사에 큰 영향을 끼쳤다. 진경산수화와 풍속화를 유행시켰고, 조선에 서양식 화법을 들여오기도 했다. 또한 화가인 단원 김홍도와 자하 신위의 스승이기도 하였으니, 조선의 그림을 바꾼 인물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처남 류경종, 친구 허필과 절친했다. 또한 성호 이익, 현재 심사정, 호생관 최북 등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 교유했다. 8세에 시를 짓고 13~14세에 쓴 글씨를 얻어다 병풍을 만든 사람이 있을 정도로 일찍부터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32세 때 가난으로 경기도 안산으로 이주, 처가인 진주류씨 집안으로부터 물질적·정신적 도움을 받으며 그의 예술 세계를 형성해 갔다.
18세기 화가 야유회 모습 담은 '균와아집도'
시원한 폭포·소나무 한쌍 끼고 둘러앉아
산야에서 그림 그리고 바둑 두며 '흥취 만끽'
애제자 '김홍도'와의 친분도 여실히 드러나
부친의 일로 집안이 몰락한 강세황은 안산으로 삶의 터전을 옮긴 후 초야에 묻혀 거문고를 즐기면서 문인이자 화가·평론가로서 당대 예술계의 총수로 자리 잡아갔다. 벼슬길이 막혀버린 후 가난을 견디지 못해 처가가 있는 안산으로 내려간 강세황이 지독한 생활고를 겪으면서도 거문고와 벗하며 학문과 그림에 정진할 수 있었던 것은 부인 류씨 덕분이었다. 빈곤한 살림살이에도 처남 류경종의 도움으로 여러 문인과 교류를 하며 높은 안목과 학식을 키워나갈 수 있었다.
그런 그는 환갑이 넘어서야 영조의 배려로 벼슬길에 나아갈 수 있었다. 61세가 되던 해 영조의 배려로 처음 벼슬길에 올랐다. 66세에는 문신정시(文臣庭試)에 수석 합격했다. 영릉참봉(英陵參奉), 병조참의,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 등을 거쳤다. 1785년 중국 건륭제의 나이 75세, 즉위 50년을 축하하는 천수연에 참석하기 위해 파견된 사행단의 부사(副使)가 되어 베이징을 다녀왔다.
 그래픽=장수현기자 |
◆강세황과 '균와아집도'
이런 강세황이 안산에 살던 시절,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그림이 있다. 강세황이 거문고를 얼마나 즐겼는지, 당대 예술인들의 풍류 모임이 어떠했는지 가늠해볼 수 있는 작품이다. 당대 대표적 화가들이 중심이 된 구성원들이 야외에서 풍류 모임을 갖고 그 모임을 그림으로 남긴 '균와아집도(筠窩雅集圖)'이다. 18세기 후반을 대표하는 화가들인 표암 강세황, 현재 심사정(1707~1769), 호생관 최북(1712~?), 단원 김홍도(1745~?), 연객 허필(1709~1768), 김덕형(1750~?) 등 8명이 주인공이다.
모임 장소인 균와(筠窩)라는 곳이 어디인지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안산 인근일 것으로 추정된다. 모임 시기는 1763년 4월10일. 음력이니 모인 날은 화창한 늦은 봄날이었을 것이다. 이들은 모임을 갖고, 모임을 기념하는 이 그림을 합작으로 남겼다. 발문에 이러한 내용으로 남겼는데, 발문을 쓴 이는 강세황과 친했던 문인 서화가였던 연객(煙客) 허필이다. 허필은 시·서·화 모두에 뛰어났고, 산수화와 인문화에 능했다.
먼저 균와아집도 상단 오른편에 써놓은 발문의 내용을 보자. '책상에 기대어 거문고를 타는 사람은 표암(강세황)이고, 곁에 앉은 아이는 김덕형이다. 담뱃대를 물고 곁에 앉은 사람은 현재(심사정)이다. 치건(유생이 평상시에 쓰던 두건)을 쓰고 바둑 두는 사람은 호생관(최북)이고, 호생관을 마주하고 바둑을 두는 사람으로 추계(미상)이다. 구석에 앉아 바둑 두는 것을 보는 사람은 연객(허필)이다. 안석에 기대어 비스듬히 앉은 사람은 균와(미상)이다. 균와와 마주하여 퉁소를 부는 사람은 김홍도이다. 인물을 그린 사람은 또한 홍도(김홍도)이고, 소나무와 돌을 그린 사람은 현재이다. 표암은 그림의 위치를 배열하고, 호생관은 색을 입혔다. 모임의 장소는 곧 균와이다. 계미 1763년 4월10일 연객 허필이 적다.'
이 그림을 보면 크게 두 장면으로 나눠볼 수 있다. 하나는 강세황이 거문고를 타고 김홍도가 퉁소를 불고 있는 음악 풍류 장면이다. 이를 균와는 안석에 기대어 듣고 있고, 심사정은 담배를 피며 감상하고 있다. 어린 김덕형은 강세황 옆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다. 거문고를 연주하는 강세황의 모습 중 거문고 부분은 대부분 훼손되어 아쉬움이 크지만, 거문고 괘가 있는 부분을 오른손으로 타고 있는 모습의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최북과 추계가 바둑을 두는 장면이다. 허필은 옆에서 훈수를 두고 있다. 이 모임 주인공은 안석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있는 균와인데, 이 인물은 균와(筠窩) 신광익(1746~?)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담뱃대를 물고 있는 심사정도 비스듬히 누워있다. 얼굴과 상체 부분이 많이 떨어져 나갔지만, 남아있는 모습의 분위기로 보아 최고 연장자이거나 균와와 비슷한 연배인 것으로 보인다. 심사정은 이 그림의 근경과 산수배경을 그렸다. 절벽과 작은 폭포 앞에 두 그루 소나무가 춤을 추듯 짝을 이루고 있고, 화명 아래에는 바위들이 적절하게 막아서고 있다. 문인화의 대가다운 진솔한 화풍은 이 모임의 격조를 높이고 있다는 평을 듣는다.
◆강세황이 거문고 연주자로 등장
한양의 근교인 안산을 주 근거지로 활동하던 당대의 대표적 예술가(화가) 지식인의 야외 풍류모임이 어땠을지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이들은 가끔 야외 풍류 모임을 가졌을 것이고, 그런 모임 중 대표적 모임을 이날로 생각하고 그 기록을 남겼을 것이다. 이런 모임에 강세황이 거문고 연주자로 등장하고 있다. 그는 시와 글씨, 그림 등 여러 가지 예술에서 높은 경지에 오른 인물이었지만, 이 작품에서 거문고 연주자로 묘사되고 있음은 그가 얼마나 거문고를 좋아하고 거문고 연주에도 뛰어났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하겠다.
같이 등장하는 김홍도는 강세황의 애제자인데, 그 역시 그림뿐만 아니라 시와 글씨, 악기들도 잘 다뤘다. 그의 스승 강세황은 김홍도에 대해 '음률에 두루 밝았고 거문고와 대금, 시와 문장도 그 묘를 다하였다'라고 칭찬했다. 그리고 김홍도의 퉁소 소리는 맑고 가락이 높아 멀리서 이것을 들으면 신선이 학을 타고 생황을 불며 내려오는 것이라고 할 만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한편 강세황은 허필과 '연옹(허필)이 나(강세황)를 아는 것이 내 스스로 나를 아는 것보다 낫다'라거나 '표암의 서화첩에 연객의 평이 없으면 점잖은 선비가 갓을 쓰지 않은 것과 같다'라고 할 만큼 서로 절친했고, 서로의 예술세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김봉규 <문화전문 칼럼니스트> bg4290@naver.com
[동추 거문고 이야기]〈1~12〉연재를 시작하며, 설중매와 가장 잘 어울리는 악기 거문고…맑은 기운 도는 성인군자 닮아
[동 추 거문고 이야기] <12〉 강세황과 거문고
강세황(1713~1791)은 70대의 나이에 청나라 사신의 일행으로 중국 베이징에 갔을 때 많은 현지인들이 그의 그림을 구하려 할 정도로 유명했던 화가였지만, 과거시험 장원급제(6..
www.yeongnam.com
'书评---名品寶鑑'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위클리포유 커버 스토리] 2024 주말적 허용 - 정치, 그 쓸쓸함에 대해…정말…뽑아도 될까? (2) | 2024.07.03 |
|---|---|
| [위클리포유 커버 스토리] 2024 주말적 허용 - 새해부터 닥친 재난 앞에서…갈라진 땅·무너진 맘 위한 '반창고' 없나요 (1) | 2024.07.02 |
| [위클리포유 커버 스토리] 예측 불가능한 재난…인류는 '희망'이란 이름으로 극복했다 (0) | 2024.07.01 |
| 국내외 유명 평론 리뷰 사이트는 어떤 곳이? (1) | 2024.05.21 |
| 블로그 책리뷰, 어떻게 하시나요? (0) | 2024.0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