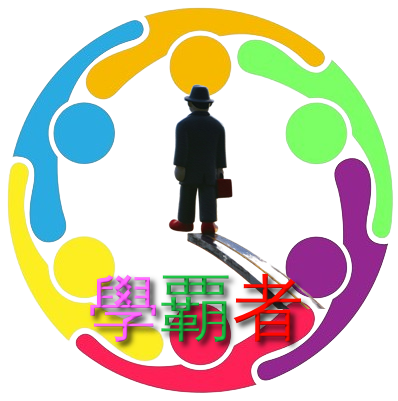2024년 새해에 고집불통(固執不通)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논어(論語)’ 헌문(憲問) 편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미생무(微生畝)가 공자(孔子)를 일러 말했다. “구(丘·공자의 이름, 예전 성균관 한림원 선생님들은 ‘某’라고 읽었음)는 어째서 이다지도 연연해 하는가? 말재주를 부리는 것이 아닌가?”
微生畝謂孔子曰: 丘, 何爲是栖栖者與 無乃爲佞乎?
미생무위공자왈: 구, 하위시서서자여? 무내위녕호?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내 감히 말재주를 부리려는 것이 아니라, 고집불통(固執不通)을 미워하는 것이다.”
孔子曰 非敢爲佞也 疾固也.
공자왈: 비감위녕야, 질고야.
미생무란 사람에 대해 주자(朱子) 주(註)에선 ‘미생이 성이고 무가 이름이다. 미생무가 (감히) 공자의 함자(銜字)를 부르면서 말이 매우 거만한 것으로 보아, 아마도 나이와 덕(悳)이 있으면서 은둔(隱遁)한 자인 듯하다’라고 했습니다. 연연하다(서서·栖栖)는 말은 일반적으로 정처없이 사방에 떠돌아다님을 뜻하는 말로 해석됩니다. 공자의 대답에서 고(固)라는 말은 주자 주에선 집일이불통(執一而不通), 즉 한 가지에 집착(執着)해 두루 통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어떤 책에선 ‘편벽(偏僻)되다’로 해석하고 있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대학 시절, 저는 논어를 읽던 중 이 구절과 마주치고 경악(驚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공자가 고집불통을 미워한다고? 공자라는 인물이야말로 마치 모든 완고(頑固)한 보수성(保守性)과 수구주의(守舊主義)의 원조라 여기는 통념(通念)에서 저 역시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탓이죠. 당시엔 공자마저도 미워할 더 극악한 보수주의자(保守主義者)가 있었던가? 한참을 생각해 본 후, 전 그날의 일기에 이 충격(衝擊)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공자에게도, 우리에게는 마치 구질서의 원초적 정점(頂點)처럼 여겨지는 그에게도, 부단히 변화하고 새로워지려는 사람들을 방해(妨害)하는 거대한 습관의 틀을 항상 미워하면서 살았던 가슴속의 새가 있었던 것일까.
과연 공자가 미워한 고(固)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미생무란 사람은 논어에 등장하는 몇몇 사람들, 이를테면 원양이나 접여(接輿), 장저와 걸익과 같은 도가(道家) 계열의 은자(隱者)로 봐야 할 것입니다. 이들은 논어 곳곳에서 불쑥불쑥 나타나 공자를 측은히 여기면서 매우 오만(傲慢)한 태도와 어조로 ‘헛된 짓좀 그만 하시지’라며 점잖게 타이르는 배역을 맡고 있습니다. 무엇을 타일렀던 것일까요?
공자는 자신의 이상을 현실정치에 펼쳐보이려 했습니다. 온갖 전란과 난신적자, 하극상으로 점철된 춘추 말기의 혼란상은 통치자(統治者)의 도덕성 회복 없이는 극복될 수 없는 처절한 현실이었습니다. 인정(仁政)을 바탕으로 한 이상국가! 정명(正名)의 원칙 아래 모든 사람이 자신의 직책과 직분(職分)에 성실함으로써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어찌보면 나이브하면서도 래디컬한 국가를 실제로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려 했고, 천하를 주유하면서 제후들을 설득(說得)시켜 그 이상을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이같은 이상이 자신 혼자서 일시 일대(一代)에 이룩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학단(學團)을 조직했고, 전통문화와 제도의 정수(精髓)들을 그 제자에게 전수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또한 적극적으로 노(魯), 제(齊), 위(衛), 진(晉) 등 각국의 정계에 등용(登用)시키고자 했지요. 나를 쓰든지, 아니면 내 제자(弟子)들을 쓰시오! 이때를 전후해서 학식과 교양을 갖춘 사인(士人)이라는 최초의 지식인 계층이 동양사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그들의 의식과 행동, 그리고 정체성 확립에 공자의 학단(學團)은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인들은 서주(西周)시대 이래의 종법적(宗法的) 혈연관계에서 떨어져나온 귀족의 방계 후예들과, 몰락한 주(周) 왕실에서 흩어진 하급관리 출신이 많았습니다. 실존인물(實存人物)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노자(老子)도 주 왕실의 도서관 사서 출신이었다고 알려져 있죠(이게 사실이라면 베이징대학의 사서였던 마오쩌둥(毛澤東)과 묘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 대다수는 당시와 같은 난세(亂世)에서 어떻게 처신했을까요? 바로 은거(隱居)였습니다. 그래서 접여는 미친 척 하며 세상을 돌아다녔고, 장저(長沮)와 걸익(桀溺)은 벽지에 숨어 농사를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나가는 길목에 미리 숨어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참 이상하게도 논어(論語)의 이런 부분들은 무척 리얼리티가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들이 당시 지식인의 대다수(大多數)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무력감과 허무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공자의 모습이 과연 어떻게 비쳐졌겠습니까. 세상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제후(諸侯)들 앞에서 말재주를 부려 구차하게 입신(立身)을 바라는 자로 보였던 것이죠. 논어 미자(微子) 편에서 걸익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도한 것이 천하가 다 이러한데, 누구와 더불어 바꾸겠는가(滔滔者天下皆是也, 而誰以易之)? 도도한 것이라…. 우리는 어느덧 고(固)의 정체(正體)에 가까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공자와 당시 지식인(知識人)들 사이의 갈등(葛藤)이었습니다. 심지어 공자의 면전에서 예(禮)를 무시하는 방법으로 그를 대놓고 희롱(戲弄)하는 자까지 있었습니다. 공자조차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는지 들고 있던 지팡이를 휘둘러 그의 정강이를 공격(攻擊)하는, 의외로 다이내믹한 장면이 논어(論語) 헌문편((憲問篇))에 나옵니다.
沐浴之公論 목욕지공론; 역적의 토죄에 관한 공론. 논어(論語) 헌문편(憲問篇)의 “陳成子弑簡公, 孔子沐浴而朝, 告於哀公曰, 陳恒弑其君, 請討之”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이들이 바로 공자가 말한 고집불통(固執不通)의 실체였을까요? 이 고(固) 라는 말에 대해서는 주주(朱註)조차 아무런 구체적인 설명(說明)이 없습니다. 마치 이런 당연한 걸 뭘 물어보나? 자네가 알아서 생각하라는 듯이 말이죠. 포함의 고주(古註)엔 ‘세상이 고루한 것을 싫어해 도로써 그것을 교화(敎化)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고집불통이란 자신의 도가 쓰이지 않는, 패도(覇道)가 횡행하는 당시의 정계(政界)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유석재의 돌발史전' 中에서
'保管室---綜合資料'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고전칼럼 | 손자와 조조, ‘말폭탄’을 비웃다 (2) | 2024.01.10 |
|---|---|
| 읍참마속(泣斬馬謖)은 마속(馬謖) 죽이기 읍참(泣斬)이 아니다 (2) | 2024.01.09 |
| 내 고통(苦痛) 남 행복(幸福) (4) | 2024.01.07 |
| 바다와 연결된 덴마크 (4) | 2024.01.06 |
| 나이 관련 한자표기 (2) | 2024.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