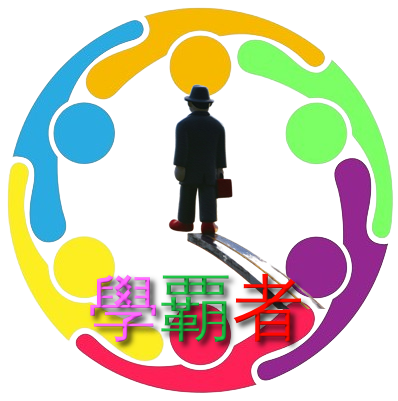내가 상상하는 SF
아트앤스터디
인문학 교육 포털. 진중권, 이정우, 강신주, 장의준. 대표 인문학자들의 인문학 특강!
www.artnstudy.com
복도훈(문학평론가)
SF, 미래에 대한 문학적 질문
국내외 SF(Science Fiction)를 본격적으로 읽게 된 것은 2008년 전후다. 당시 내가 품고 있던 화두는 이것이었다. 미래. 우리의 삶에서 파괴되는 것은 어쩌면 미래가 아닐까. 선진화, 녹색성장 등의 어휘들은 우리를 몰아치면서 강제로 앞으로 떠미는 진보의 폭풍이 아닐까. 대다수를 채무자로 만드는 금융자본주의의 미래는, 국가와 자본에 저당 잡힌 미래, 우리가 진 빚으로 식민화되는 텅 빈 미래가 아닐까. 그렇다. 따라서 최근 한국 SF가 아포칼립스를 지향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런데 나는 이것조차 희망의 징조로 간주하고 싶다. 어쨌든 작가들이 미래를 상상하기 시작했으니까.
문제는 그 미래가 현재의 연장에 불과한, 공허한 미래로 재현된다는 것이다. 내가 SF에서 미래라고 부르는 것은 단지 시제를 뜻하지는 않는다. 그 미래는 오늘날 그 의미가 거의 실종되다시피 한 어휘인 유토피아적 충동과 관련이 있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 정말 어려운 일이다. 차라리 자본주의의 종말보다는 세계의 종말을 상상하는 것이 더 쉽지 않은가. 유토피아적 충동보다 리셋 충동이 더 유혹적이다. 필립 K. 딕의 디스토피아 SF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꾸는가』(1968)를 보자.
이 소설에서 형상화되는 미래 세계에 사는 인간들을 지배하는 주된 정서는 바로 미래 없음에서 비롯되는 우울이다. 그러나 정신분석가 라캉이 말한 것처럼, 우울은 영혼의 한 상태라기보다는 도덕적인 질병에 가깝다. 내게 SF는 가능한, 대안적인 미래 그리고 그것을 고안하는 어휘와 개념을 상상하는 문학이라는 것이 매력적이었다. 이러한 대안은 오래 전에 문학에서 말하던 전망과는 다르다. 모든 SF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여러 강좌에서 수강생들과 함께 읽은 SF는 미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급진적이었다.
그 작품들은 타자성, 섹슈얼리티와 젠더, 미래, 생태학적 공존, 대안 역사, 혁명과 유토피아에 관한 그 어떤 문헌만큼이나 자극적이면서도 매력적인 아이디어를 풍부하게 제공해주고 있었다. 나는 SF는 미래 없음에 절망하지 않고, 비관 속에서도 희망을 꿈꾸는 섬세한 방법과 지도를 그리는 문학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SF, ‘과학’과 ‘소설’ 사이에서
대중문학의 하위 장르 정도로 치부하고 있다가 막상 SF를 읽게 되면 다들 어렵다고들 한다. 물론 하드 SF가 있다. 어쨌든 SF는 과학을 공부해야 읽을 수 있는 소설이라고 생각한다. 그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떨까. SF를 읽으면서 과학을 제대로 배운다고 생각해보면 어떨까. ‘평행우주’나 ‘진화론’ 같은 개념들 말이다. 그런데 이때 과학은 인문과학에서 자연과학에 이르는 지(知)에 대한 다른 이름이다.
나는 SF의 진지한 독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SF의 ‘과학’(science)을 인식적인 가설로 보고 있다. 과학적으로 사실이냐 거짓이냐, 검증된 가설이냐, 아니냐는 SF에서 ‘과학’을 이해하는 데 그리 중요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 이 때문에 SF에 접근하는 것을 어렵다고 생각하는 독자들이 생겨났다. 나 역시 그랬다. 그렇지만 우리는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1818)이 근대 SF의 시초로 알고 있다. 『프랑켄슈타인』의 서문에도 나오는 것으로, 에라스무스 다윈은 죽은 개구리에 전기충격을 줘 개구리가 움직이는 것을 실험했고, 나아가 전기가 죽은 사람을 부활시킬 것이라고 믿었다.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 사이비 실험이지만, 그때만 해도 그것은 여러 과학적 가설과 상상적인 실험을 낳게 한 ‘과학’이었다. 그리고 그 과학이 던진 상상력 있는 질문 덕택에 『프랑켄슈타인』과 같은 독특하고 낯선 ‘소설’(fiction)이 탄생했다.
이 소설은 우리에게 계몽주의, 과학의 이면을 알려준다. 세계를 탈주술화했던 근대과학 역시 또 다른 주술이 되었다는 것. 과학소설에서 인식적인 가설이자 방법론인 ‘과학’은 가능 세계를 증명하는 양상논리학이나 잠재성에 상응한다고 볼 수 있다. 방법적 가설이라는 측면에서 과학소설에서의 ‘과학’은 훌륭한 허구를 낳는 연금술 제조기다. 마찬가지로 과학소설에서의 ‘소설’ 또한 과학의 사고 실험으로 현실을 다차원적인 방식으로 낯설게 만든다는 데서 그 어떤 문학 이상으로 문학적일 수 있다. 이미 우리는 SF가 던진 질문 속에서 살고 있다. 이를 마냥 외면하면서 살기도 쉽지 않다.
필자 소개복도훈 (문학평론가)
「1960년대 한국 교양소설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5년에 『문학동네』를 통해 등단했으며, 2007년 현대문학상(평론)을 수상했다. 평론집으로 『눈먼 자의 초상』(2010), 『묵시록의 네 기사』(2012)가 있으며, 『성관계는 없다』(2005)를 공역했다. 포스트 좀비 아포칼립스 장르와 국내외 과학소설을 즐겨 읽으며, 이에 대한 강의와 집필을 병행하고 있다.
내가 상상하는 SF
아트앤스터디
인문학 교육 포털. 진중권, 이정우, 강신주, 장의준. 대표 인문학자들의 인문학 특강!
www.artnstudy.com
'名文---명작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인생의 찰나성을 예술로 극복하다”-셰익스피어의 <소네트집> (6) | 2024.11.10 |
|---|---|
| 지젝 철학의 욕망의 윤리에 대하여 (7) | 2024.11.09 |
| 우리는 왜 책을 읽어야 하는가? (22) | 2024.11.07 |
| 구조적 배제의 문제와 약자들 (7) | 2024.11.07 |
| 혁명은 왜 고독해야 하는가 (13) | 2024.11.06 |